- 병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선으로 달려간다.
- 그리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 국가는 참전군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의 반전(反戰) 사학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들어 보면….

미국의 반전 사학자 하워드 진.
논점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참전했던 젊은이들이 결국엔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전쟁에서 몸과 마음을 다쳐 돌아온 병사들이 겪는 참담한 고통을 열거하면서 역대 미 행정부가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잊혀진 존재’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그의 칼럼을 발췌한 내용이다.
지난해 12월30일자 ‘뉴욕 타임스’에 실린 제프리 게틀먼의 사진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24세인 게틀먼은 지난해 미군 하사로 이라크전쟁에 참전해 유프라테스 강둑을 경비하다 반미 게릴라가 쏜 파편에 얼굴을 맞았다. 5주 동안 미 육군병원에서 혼수상태로 누워있다 깨어난 그는 결국 장님이 됐다. 2주 뒤 게틀먼은 동성(Bronze Star)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훈장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를 옆에서 돌보는 아버지는 말한다.
“아마도 하느님은 네가 이라크에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고 여기셨나봐(그래서 너를 장님으로 만드셨나봐).”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는 지난 1월 이미 500명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1명 사망에 부상은 4∼5명꼴이란 사실을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중상을 입었다’는 형식적인 보도만으로는 미 국민들에게 공포를 실감나게 전해주지 못한다.
펠드부시 하사의 부모는 육군병원에 입원한 아들 곁에서 거의 두 달간 병구완을 해왔다. 펠드부시의 어머니는 어느날 병원 복도를 기어가는 여자 부상병을 봤다. 두 다리가 잘려나간 채 기어가는 그 뒤를 이제 겨우 세 살 난 그녀의 아들이 아장거리며 따라가고 있었다.
“부시의 석유전쟁에 아들 빼앗기다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지구 반바퀴 저편에 있는 이라크로 보내고 싶어 안달했다. 미군 병사들이 무시무시한 첨단무기를 지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미 게릴라들의 기습공격엔 취약하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장님이 되고 불구의 몸이 된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불필요한 전쟁의 위험 속으로 젊은이들을 몰아넣은 것 자체가 바로 부시 행정부가 젊은 세대를 근본적으로 배신한 것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
부상병들의 가족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그런 점을 파악하고 있다. 루스 아이트켄은 지난해 4월4일 육군 대위인 아들을 이라크에서 잃었다. 그녀는 “이 전쟁은 석유를 위한 거야”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우린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 아들은 바그다드공항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말한다.
“그 애는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싸웠겠지만, 이번 이라크전쟁은 미국민과 병사들에게 선전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부시의 석유(Bush’s oil)’를 위한 전쟁에서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다.”
이라크전쟁에서 사랑하는 아들 또는 딸을 잃었거나 크게 다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만이 부시에게 배신당한 것은 아니다. 이라크 국민도 부시로부터 배신당했다. 이미 두 차례의 전쟁(이란-이라크전쟁, 제1차 걸프전쟁)과 12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참담한 고통을 겪어온 이라크 국민에게 부시는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군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펜타곤(미 국방부)은 ‘충격과 공포’ 작전을 자랑스레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해 이라크인 약 1만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불구의 몸이 됐다.
배신의 목록을 작성하자면 참으로 길다. 부시 행정부는 세계평화의 희망을 저버렸다. 5000만명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뒤 유엔(국제연합)이 들어설 때 유엔헌장은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배신당했다. 냉전과 ‘공산주의의 위협’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국방비로 낭비할 명분이 되진 못한다. 천문학적인 국방비는 미국 어린이들의 교육비를 갉아먹었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돌아갈 의료혜택을 줄였다. 그뿐인가. 노인복지, 무주택자(homeless)와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삭감하도록 만들었다.
역대 전쟁은 배신의 역사 지녀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병사들은 배신을 당해왔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국방의 의무와 애국주의 같은 숭고한(grandiose) 거짓말을 들으며 전쟁터로 이송됐다. 미 독립전쟁 당시 젊은이들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겠다고 독립을 선언했던 지도자들(이른바 Founding Fathers)에게 배신당했다. 그들이 헐벗고 장화조차 신지 못하며 고생하는 동안 고급장교들은 사치를 즐겼고 상인들은 전쟁특수로 현금을 챙겼다. 급기야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일부는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처형당했다.
독립전쟁이 끝난 뒤 서부 매사추세츠의 농민들은 농토를 빼앗기지 않으려 대들었지만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했다. 농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독립전쟁에 참가해 워싱턴 밑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퇴역군인들이었다.
지금의 뉴멕시코 지방과 캘리포니아 지방을 강탈한 미국-멕시코전쟁(1846∼47년), 그리고 남북전쟁(1860∼64년) 때는 수천 명의 병사가 불만을 품고 탈영했다. 부잣집 아들들은 돈을 써서 징집에서 빠졌고, J.P. 모건 같은 금융업자들은 전선에서 전사자가 늘어날수록 돈을 벌었다. 흑인 병사들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인종차별과 빈곤이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사에서도 배신의 기록은 빠지지 않는다. 혹독한 전쟁에서 몸과 마음을 다친 채 돌아온 병사들은 불경기 속에서 실업자의 고통을 겪었다. 마침내 미 전역에서 2만명에 이르는 참전군인과 그 가족들이 워싱턴으로 모여들어 포토맥 강가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다. 미 의회가 약속했던 수당(bonus)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퇴역군인들은 끝내 총격과 최루탄에 밀려났다.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들도 미국 행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 전후 그들은 부도덕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내몰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잊혀지길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됐음을 깨닫게 됐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은 화학제제인 고엽제(Agent Orange)를 마구 뿌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베트남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암환자가 늘어났고 기형아 출생이 늘어났다. 미군 병사들도 고엽제에 직접 노출돼 후유증을 앓았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고엽제의 영향은 별것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 케미컬(Dow Chemical)이 1억8000만달러를 피해자 가족에 보상해주기로 합의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구10만으로 나누면 고작 1000달러가 조금 넘는 액수였다. 미 행정부는 베트남에 수천억 달러를 전쟁비용으로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집 없는 참전군인이나 재향군인, 병원을 드나드는 부상병들, 그리고 정신적 상처로 고통받거나 자살하는 참전군인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
제1차 걸프전쟁(1991년) 때 이라크의 인명피해는 1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단지 148명의 미군이 전사했을 뿐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반면 20만6000명의 재향군인회원들이 걸프전쟁에서 비롯된 부상과 질병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숨기려 들었다. 재향군인회에 따르면 걸프전이 끝난 뒤 12년 동안에 8300명이 사망했고, 16만명이 육체적·정신적 장애(disability)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참전군인들에 대한 배신은 이어졌다. 미군 병사들은 ‘해방군’으로서 꽃다발 환영을 받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랐다. 반미 게릴라의 저항으로 날마다 병사들이 죽고 다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라크 국민은 미군이 자국 땅에 머무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이라크 주둔 제3보병사단 장교의 말을 이렇게 전했다.
“잘못 보도하지 말라. 내가 아는 한 병사들의 사기는 높기는커녕 바닥이다.”
이라크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실명하거나 팔다리를 잃은 병사들은 부시 행정부가 참전군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 부시는 올해초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참전군인들에게 경의를 나타냈지만, 수천 명이 부상으로 귀국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부시가 이라크를 기습방문하자 미 언론들은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독일 란트스툴의 미군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는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
“내가 보기에 부시의 추수감사절 ‘깜짝쇼’는 (언론보도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미 육사(West Point)를 졸업한 젊은 중위를 비롯해 19명의 부상병을 돌보고 있었다. 젊은 중위는 마치 어린아이마냥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대며 절망감을 나타내곤 했다. 어떤 부상병들은 시력을 잃거나 팔다리를 잘린 상태였다. 부시가 추수감사절 방문에서 부상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주 고약한 일이다. 부상병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아마 죽었다 깨나도 미국 신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읽지 못할 것이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미 작가 달턴 트럼보의 소설 ‘조니는 총을 가졌다’(Johnny Got His Gun, 1939년판)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실명한 데다 팔다리까지 잃은 상이군인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뿐 말을 하거나 듣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는 또렷이 기억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연설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던 일을…. 그는 마침내 전보를 보낼 때 쓰는 모스 부호를 머리로 두드려대 남들과 통신을 주고받는 방법을 익힌다. 그리곤 정부 관리들에게 학교 교실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한다. 아이들에게 전쟁이란 게 어떤 것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그러나 그는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 작가 트럼보는 이렇게 소설의 끝을 맺었다. “그들은 오로지 그를 잊고 싶어했다(They wanted only to forget him).”
이라크에서 돌아온 상이군인들도 같은 요구를 한다. 자신들을 잊지 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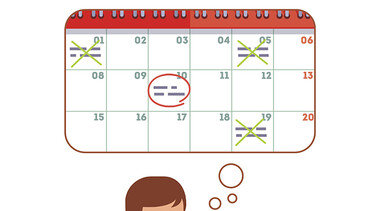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