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 속에 살아남은 양심의 기록
사고(社告), 복자(覆字), 먹질로 ‘검열 드러내기’
지면 곳곳에 기록된 “‘신동아’ 특유의 전투력과 투지”
창간 1년 만에 79건 검열 삭제, 2년 차엔 110건으로 더욱 증가
“報導(보도)를 할 ᄯᅢ에는 暗示性(암시성)을 超高度(최고도)로”
“不得已(부득이)한 事情(사정)으로 全部(전부) 略(략)”
“신동아, 타협했지만 굴종하지 않았다”
![[최수일 제공]](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1/7b/82/86/617b828626dad2738276.jpg)
[최수일 제공]
조선왕조실록 순종 3년(1910) 8월 22일자에 기록된 ‘한일병합조약’ 제1조 내용이다. 이날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어진 우리 역사의 암흑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한다. 일본제국주의가 힘으로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기간이다.
검열 뚫고 살아남은 양심의 기록
‘신동아’는 그사이 약 5년에 걸쳐 우리말 잡지를 발행했다. 1931년 11월 창간호부터 ‘일장기말소사건’ 여파로 폐간되는 1936년 9월호까지, 매달 발행하는 ‘신동아’ 부수는 최소 1만 부가 넘었다. 특집호를 낼 때는 2만 부를 넘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발행부수나 영향력 면에서 명실상부 국내 1등 매체였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그 시대 신동아가 걸었던 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최수일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그 배경에 “타협과 굴종보다는 비타협과 저항 쪽에 먼저 손이 가는 식민지 학문 후속 세대의 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931년은 일제 군국주의가 극을 향해 치달아가던 시기다. 신동아는 그해 11월 일제의 공식 허가를 받고 창간했다. 탄생 과정부터 ‘타협’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 교수는 “그것이 곧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최 교수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매체 검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창간 후 3년 동안 발행된 신동아 36권 전체를 분석해 지면 곳곳에 남은 검열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가 지난해 5월 학술지 ‘한국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잡지 신동아와 검열의 역학’에 따르면 해당 시기, 신동아가 일제에 검열당해 전체 혹은 부분 삭제한 기사 수가 286개에 이른다. 최 교수는 “이것은 비슷한 시기 발행된 다른 잡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많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최 교수 설명이다.
“1933년 11월 ‘조선중앙일보’가 월간 ‘중앙’을 창간했다. 신문사가 발행한 월간잡지라는 점에서 신동아와 성격이 유사한 매체다. 그런데 중앙의 경우 ‘일장기말소사건’ 여파로 폐간당하는 1936년 9월호까지 통권 31호에 걸쳐 검열당한 기사가 70여 개 수준이다. 조선일보가 창간한 ‘조광’의 경우 검열에 저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반면 신동아는 창간 첫해에 이미 기사 79개가 검열에 걸렸다. 그 가운데 15개는 전문 삭제를 당했다. 창간 2년차가 되면 검열당한 기사량이 110개로 더욱 크게 늘어난다. 미디어 성격과 기사 내용, 검열 양상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겠지만, 검열 기사 건수는 그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있다.”
창간 1년 만에 79건 검열 삭제
![1931년 11월 창간한 ‘신동아’ 표지(왼쪽). 창간호 43쪽 하단 본문 글씨 일부가 검열의 흔적인 XX 표시로 가려져 있다. [조영철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1/7b/83/23/617b8323061dd2738276.jpg)
1931년 11월 창간한 ‘신동아’ 표지(왼쪽). 창간호 43쪽 하단 본문 글씨 일부가 검열의 흔적인 XX 표시로 가려져 있다. [조영철 기자]
최 교수는 신동아 기사 검열 건수가 유난히 많았던 두 번째 이유로 “집요하게 검열의 틈새를 파고든 신동아의 태도”를 꼽았다. 최 교수에 따르면 신동아 편집진은 시시각각 닥쳐오는 검열의 칼날 아래서 어떻게든 ‘진실 보도’ 공간을 지켜내고자 분투했다. 문장 사이사이 일제에 대한 비판과 냉소를 끼워 넣었고, ‘암시’와 ‘우회’를 통해서라도 기어이 저항 의지를 표현하려 했다. “일제가 검열 1년차에 비해 2년차 때 훨씬 더 많은 ‘문제’ 기사를 찾아냈다는 건 역으로 신동아가 더욱더 문제적 태도를 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게 최 교수 의견이다. 그는 이 검열의 기록을 “타협과 굴종이라는 시대의 오라(aura) 속에 산발했던 (당대 신동아 기자들의) 양심의 흔적”이라고 평가했다. 학자로서 이를 연구하고 조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여겼다. 그래서 그는 옛 신동아를 샅샅이 뒤져가며 검열에 걸린 기사 목록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했다. 최 교수가 오랜 노력 끝에 펼쳐 보인 당대 ‘검열난(檢閱難)’의 실상은 가슴 아프면서도 동시에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을 준다.
지면 곳곳에 기록된 “‘신동아’ 특유의 전투력과 투지”
한 번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신동아 창간은 일제와 타협한 결과물이다. 신동아는 잡지를 펴내는 조건으로 ‘검열’ 또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매달 기사를 작성하면 출판 전 총독부 도서과에 보냈고, 일제가 ‘삭제’를 지시하면 충실히 따랐다.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검열에 걸릴 걸 알면서도 굳이 삭제당할 게 뻔한 ‘문제적’ 기사를 계속해서 작성했다. 총독부가 해당 기사를 싣지 못하도록 지시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든 지면에 기록하려 애썼다. △글씨 일부를 ‘XX’ 등의 표시로 지우는 복자(覆字)를 사용하거나 △지면 여백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사를 생략했으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고(社告)를 싣거나 △때로는 지면 일부를 아예 ‘검은 먹지’가 되도록 뭉개버리기도 했다. 독자들이 신동아를 통해 해당 기사 내용을 읽지는 못해도 최소한 ‘뭔가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검열의 현시(顯示)’ 즉 ‘드러냄’이 일제강점기 신동아가 취한 주요한 저항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럼 일제강점기 신동아에 남아 있는 검열의 흔적을 살펴보자. 신동아1932년 1월호 1쪽 ‘권두언’을 펼치면 문장 첫 머리에 ‘三行省略(3행생략)’이라는 네 글자가 뚜렷이 보인다. 문장 도입부가 검열 과정에서 삭제됐음을 표시한 것이다.
신동아 1932년 3월호 107쪽엔 ‘사고’가 실려 있다. “3편(三篇) 논문(論文)은 부득이(不得已)한 사정(事情)으로 전부(全部) 략(略)하게 되엿사오니 집필자(執筆者)와 독자제위(讀者諸位)에게 미안한 마음이 그지없읍니다”라고 쓰여 있다. 신동아는 검열 당국이 원고 전면 삭제를 요구했을 때 이런 식의 사고를 냈다.
신동아는 검열에 걸린 기사 본문을 삭제하면서도 제목만은 남겨둠으로써 독자가 행간의 의미를 짐작해볼 여지를 주기도 했다. 1932년 9월호 신동아 12쪽에 실린 사고(社告)를 보자. “신태익이 쓴 ‘조선농가(朝鮮農家)를 포위(包圍)한 대농업자본진용(大農業資本陣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싣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제목만 봐도 일제의 경제 침탈을 비판한 내용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동아 지면을 넘기다 보면 XX·OO 등의 표시로 글씨 일부를 가린 ‘복자(覆字)’, 몇 줄을 삭제했을 때 안내하는 “략(略)” 표기, 그리고 기사 전체를 삭제했을 때 만들어 넣은 “사고(社告)”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검열이 많았고, 동시에 저항 또한 꾸준히 이어졌다는 증거다.
이제는 또 다른 방식의 저항 흔적을 찾아보자. 최 교수는 “일제강점기 신동아를 보다 보면 종종 신동아 편집진의 전투력과 투지에 놀라게 된다”고 말한다. 그중 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신동아 창간호 49쪽에 실린 ‘기자실’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기자들 방담 형식으로 구성된 이 기사엔 이런 대목이 있다.
B: (중략) 우리 사회(社會)는 보도시대(報導時代)라 하지만 단순(單純)한 보도(報導)만으론 부족(不足)하지 안우. 그러니ᄭᅡ 보도(報導)를 할 ᄯᅢ에 암시성(暗示性)을 최고도(超高度)로 발휘(發揮)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힘이 드는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 필자(筆者)도 여간(如干)한 노력(努力)으론 어렵겟고 편집자(編輯者)도 지낭(智囊)을 ᄶᅩᆨᄶᅩᆨ ᄶᅡ내어야 되겟지. (일동(一同) 올치 올소)
T: 그러길래 편집기자(編輯記者) 10년(十年)만 하면 폐인(癈人)이 되지
누가 봐도 일제 검열에 대한 냉소다. 심지어 “암시성을 최고도로 발휘해”검열의 빈틈을 찾아보겠다는 각오까지 담아놓았다. 서슬 퍼렇던 시대 어떻게 이런 글을 남겼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동아 기자들이 이런 기개를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검열로 인한 기사 삭제를 안내한 ‘신동아’ 1932년 3월호 107쪽 ‘社告(사고)’(왼쪽). 신동아 1933년 4월호 145쪽.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此間(차간) 十二行(13행) 不得已略(부득이략)”이라고 쓰여 있다. 일제 검열로 일부 문장이 삭제됐음을 보여주는 표시다. [조영철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1/7b/83/4c/617b834c1654d2738276.jpg)
검열로 인한 기사 삭제를 안내한 ‘신동아’ 1932년 3월호 107쪽 ‘社告(사고)’(왼쪽). 신동아 1933년 4월호 145쪽.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此間(차간) 十二行(13행) 不得已略(부득이략)”이라고 쓰여 있다. 일제 검열로 일부 문장이 삭제됐음을 보여주는 표시다. [조영철 기자]
‘보이지 않는 검열’에 대한 노골적인 한방
신동아 1933년 4월호 192쪽에는 ‘민중고문국(民衆顧問局)’이라는 제목으로 독자 질문에 편집실이 답하는 형식의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놀랍게도 “신동아(新東亞) 잡지(雜誌)에 기재(記載)한 기사(記事)에 ‘략(略)’이란 무엇이며 왜 ‘략(略)’을 햇습니까?”이다. ‘신동아’ 편집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일제의 검열 방식을 구체적으로 폭로한다. 답은 이렇다.조선(朝鮮)서 잡지(雜誌)를 발행(發行)하려고 하면 인쇄(印刷)하기 전(前)에 원고(原稿)를 전부(全部)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국(警務局) 도서과(圖書課)에 검열(檢閱)을 마타야 하는 법(法)입니다. 원고(原稿)를 검열(檢閱)하든 검열관(檢閱官)이 원고(原稿) 중(中)에 불온(不穩)하거나 치안(治安)을 방해(妨害)할 염녀가 잇거나 기타(其他) 무슨 사정(事情)으로든지 인쇄(印刷)되여 나타나는 것을 불가(不可)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구(句)가 발견(發見)될 때에는 그 구(句)를 삭제(削除) 명령(命令)합니다. 그러면 그 원고(原稿)를 바든 편집자(編輯者)가 잡지(雜誌)를 인쇄(印刷)할 적에는 그 삭제(削除)당한 부분(部分)은 부득이(不得已) 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할 수 없는 사정(事情)으로 그 부분(部分)만을 략(略)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잡지 발행 전 검열을 거치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대중이 보는 지면에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은 일제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동아일보 1931년 3월 12일자 2면에는 ‘서울(조선)잡지협회’가 총독부를 방문해 ‘복자사용 기타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때 협회 관계자가 한 말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검열로) 삭제된 곳을 여백으로 남기지도 못하게 하고 ‘삭자(削字)’라고 기입도 못하게 하며 복자도 사용치 못하게 하면 전후 문구가 부합하지 않아 곤란하다. 이 규정을 개정해 달라.”
즉 일제는 독자들이 출판물을 읽다 검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신동아는 “조선서 잡지를 발행하려면 전부 총독부 검열을 거쳐야 한다”고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독자가 물으니 답한다는 것이 이 코너 취지지만, 질문 내용도 그렇고 답변은 더더욱 적나라해서 왠지 가공의 냄새가 물씬 난다. 요컨대 ‘보이지 않는 검열’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한 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동아는 검열관의 칼날이 상대적으로 둔해질 수 있는 문학작품과 화보 등의 지면에 일제에 대한 비판과 혐오를 담아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타협’과 ‘저항’을 표현했다.
신동아 1932년 10월호 화보에는 이봉창 의사 사진이 실렸다. 그해 1월 히로이토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사살에는 실패하고 사형당한 독립운동가다. 사진 설명에 “대역범인 이봉창”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최 교수는 이 의사 사진을 신동아 지면에 담은 것 자체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의 발로라고 봤다. 이 사진이 검열을 피해 지면에 고스란히 실린 것은 일제의 실수였다는 게 최 교수 생각이다.
신동아 1932년 10월호 97면에 실린 단편소설 ‘진남포행’에는 “일본경관의 신분검사…아-진저리가 나더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1932년 4월호에 게재된 ‘조선사화-강감찬의 귀주대첩과 권율의 행주대첩’ 가운데 “일군(日軍)이 일시(日時)에 분궤(奔潰)하여 사자(死者)가 무수(無數)하엿다” 등의 문장도 검열을 피해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동아는 싸웠다, 은밀하지만 끈질기게”
최 교수는 “일제강점기 신동아를 대상으로 이뤄진 검열에 대해 연구하며 확인한 건 그 시대 신동아가 결코 일제의 요구를 잘 따르는 ‘온건한 잡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신동아는 일제 검열에 굴복해 미디어로서의 양심이나 집단적 신념을 내팽개친 매체가 아니었다. 신동아에는 그 두께만큼의 분투와 열정 그리고 저항심이 육화(肉化)돼 있었다”고 평했다. “나는 그 시대 총칼을 들고 일본군에 맞섰던 독립군 못잖게 신동아의 비타협과 저항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최 교수의 다음 목표는 이번 연구에서 빠진 신동아 1934년 11월호부터 1936년 9월호까지의 검열 내용을 분석해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 연구의 중심은 ‘일장기말소사건’과 ‘신동아 폐간’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기약했다.
더불어 “1930년대 발간된 신동아는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아 시민은 물론 연구자들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이 신동아를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동아일보’가 해당 자료의 디지털 작업에 나서주기 바란다”는 바람도 밝혔다.
#일제강점기검열 #양심의흔적 #복자 #삭자 #신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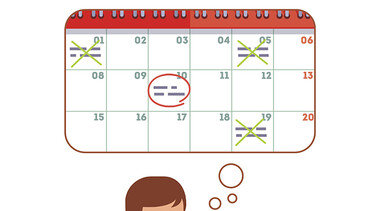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