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이 세심한 탓인지는 몰라도, 나는 해외여행의 출발일이 다가오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여행지와 일정을 떠올리면서 지참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한다. 컴퓨터에 저장된 목록을 수정하여 여행 전날까지 새로운 목록을 완성하는 건 물론이다.
이렇게 완성된 ‘여행 지참물 목록’의 강점 중 하나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수차례의 해외여행을 통해 내 목록이 대단히 실용적이며 빈틈이 없다는 게 입증됐다. 이 목록이 얼마나 훌륭한지 몇 가지 항목을 예로 들겠다.
우선 면도기의 경우, 가벼운 소형 전지 면도기를 지참하되 전지가 다 소모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형 수동 면도기를 따로 하나 지참한다. 치약은 굳이 새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여행일정을 감안해 적당히 남아 있는 것을 택한다. 자외선 차단크림, 구강 청결제 등도 필수적이다. 몇 가지 상비약도 지참한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기내에서 신을 슬리퍼를 휴대한다. 건전지가 한 개 들어 있는 꼬마 손전등과 나이프도 지참한다(나이프는 반드시 체크인하는 가방에 넣는다. 휴대하는 가방에 넣어 기내에 반입하는 일은 보안상 금지다).
나는 여행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화와 충전기를 지참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직전까지,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 수첩과 일기장도 꼭 챙긴다. 여권 복사본과 여행자 수표번호는 반드시 여권, 수표와 따로 보관한다. 여행안내서를 한 권쯤 휴대하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면 된다. 여행중 갈아입을 옷과 신발도 잘 챙겨야 하는데, 현지의 기후조건과 일정, 야외활동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만큼만 지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속옷의 경우 내 ‘여행 지참물 목록’의 원칙은 러닝셔츠나 팬티, 양말 등을 필요한 만큼 챙기되, 가급적 여행지에서 하루 이틀 입은 후 버려도 좋을 만큼 낡은 것들을 골라 가져가는 것이다.
몇 해 전 한국 학자들이 일본을 함께 여행한 적이 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 여행 목적은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참가와 관광이었다. 당시 나는 집에서 오래 입어 낡아빠진 속옷과 양말을 여행기간 필요한 만큼 챙겨 갔다. 낡고 헐어서 이미 버렸어도 좋았을 것들인데 이럴 때를 대비해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하루씩 입고 호텔방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릴 때의 쾌감이 좋았고 돌아올 땐 짐이 가벼워져 더욱 좋았다. 그 이후로 나는 해외여행을 갈 때면 항상 낡은 내의류나 양말을 챙겼다.
지난 1월 중순 나는 세 명의 학계 동료와 캄보디아의 북서 지방을 여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은 9세기경부터 13세기 무렵까지 동남아에서 맹위를 떨친 크메르 제국의 거대한 유적지다. 앙코르 와트는 12세기 전반 스리야바르만 2세의 명령으로 건립된 석조 사원인데 원래는 그의 개인 묘원으로 건립됐다고 한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교 건축물인 앙코르 와트는 ‘사원 도시’라는 뜻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9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앙코르 톰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엽에 걸쳐 자야바르만 7세의 명에 의하여 건설된 거대한 도성인데, 불교미술의 정수라 일컬어진다. ‘거대한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의 웅대한 석조물들은 크메르 루주와 캄보디아 인민공화국의 내란, 점령군의 강점, 과거 정부의 방치와 도굴에 의해 많이 훼손됐다. 거대한 석조물을 서서히 파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람에 날아와 돌 틈에 박힌 거목의 씨앗들이다. 그 씨앗들이 돌 틈에 뿌리내리고 수백년 동안 자라 거목이 되면서, 뿌리 부분이 돌덩어리들을 서서히 밀어내 붕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유적지에 남아 있는 웅대한 축조물들만 보더라도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은 실로 대단하다. 방대한 규모와 탁월한 건축양식, 건축물의 거의 모든 면을 덮고 있는 각종 문양, 저마다 전설과 역사를 지닌 뛰어난 조각….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넘어 망연자실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앙코르 롬 사원 앞에 선 필자(왼쪽)과 동료 학자들.
이번 캄보디아 여행에서도 나는 새로 보완한 ‘여행 지참물 목록’에 따라 지참물을 빈틈없이 챙겼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의 알량한 지참물들은 여행 첫날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1월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더운 날씨이므로 나는 가죽 샌들을 신고 갔다.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워낙 건조하여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흙길은 온통 묽은 흙먼지투성이였다. 운동화를 신고 갔어야 옳았다. 치약, 칫솔, 로션, 머리빗 등은 불필요했다. 호텔에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정전이 잦았다는데 이번에는 그런 적이 없어서 갖고 갔던 꼬마 손전등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하루씩 입고 버리려던 러닝셔츠와 팬티, 양말은 도로 비닐백에 담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곳에서 목격한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상이 넉넉함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낡은 옷일망정 좀더 입지 않고 함부로 버리는 일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관광지의 길거리에는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의 꼬마들이 허름한 옷차림에 맨발로 몰려다니면서 관광객들에게 손을 내밀고 새가 우는 듯한 슬픈 목소리로 구걸했다. 이는 반세기 전 6·25전쟁과 그 후 얼마간 지속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 우리는 시엠레압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동양 최대의 호수 톤레샵으로 이동하였다. 과연 호수는 바다처럼 넓지만 육지에서 호수로 통하는 수로변이나 호수 연변의 허름한 가옥에서 생활하는 수상촌 빈민들은 안쓰럽기만 했다. 수로의 물은 각종 오물로 혼탁했고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고 아이들은 그 물에서 미역을 감고 자맥질을 했다.
하노이를 거쳐 돌아오는 비행기는 밤새 하늘을 날아 새벽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와 공항버스를 탔다. 달리는 버스의 창밖으로 스쳐지나가는 도로는 넓고 깨끗했다. 주변의 새벽 경치는 흰 눈까지 내린 터라 더욱 신선해 보였다. 예전에 와보지 못한, 어느 잘사는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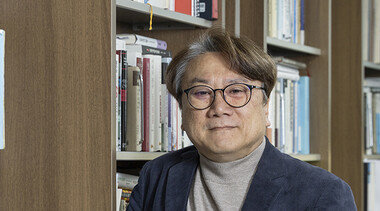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