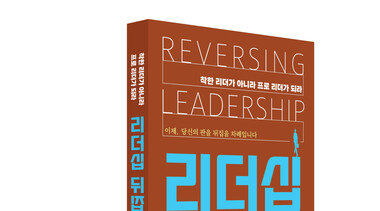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다. 히로시마 출신으로 친척과 지인을 한순간에 잃은 마루키(丸木) 부부는 원폭투하 사흘째 되던 날 히로시마에 가 그 참상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2년 뒤, 부부는 원폭참화 공동제작을 결의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점령군의 검열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열이 폐지된 1950년에야 초기에 제작한 3부작을 발표했다. 참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부부는 기도하며 온 정성을 기울여 ‘원폭의 그림’ 15부 대연작(大連作)을 완성한다. 수묵화 대가인 남편과 데생이 힘찬 아내는 수묵담채에 붉은색을 살린 지옥초지(地獄草紙) 기법으로 걸작을 탄생시켰다.
2006년 10월9일, 조선중앙통신은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호기롭게 선언했다. 이 충격적 현실을 맞아 나는 세계인을 울리고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마루키 부부의 그림을 다시 음미해본다. 그림들은 거리와 생활정경이 사라진 뒤의 피폭자 군상을 담고 있다. 한순간 옷이 불타버려 알몸이 되어버린 남녀. 손과 발, 가슴은 부풀어 오르고 보랏빛 피부가 녹아내려 빈사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유령의 행렬. 푸르스름한 섬광. 폭발, 불길, 열풍,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단 한 발로 24만명을 살상한 원폭 파괴를 마루키 부부는 두루마리 그림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으로 펼쳐 나간다.
전쟁 중에는 나체 묘사를 금압했던 만큼 그들에게 피폭자의 참화를 묘사하는 것은 목격자의 사명이자, 나체를 그릴 수 있다는 해방로이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인간회복’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전쟁 전에 추상화를 그리던 화가들도 인체를 묘사하게 됐다. 그러나 점령군의 검열에선 버섯구름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허용됐지만 인체에 미친 참화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켈로이드로 뒤덮여 죽어가는 나체군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버럴리즘을 요구했다. 알랭 레네의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1959)은 히로시마를 방문한 프랑스 여성과 일본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눈다. “너는 히로시마에서 무엇을 보았지?” “원폭 돔과 원폭자료관을 봤어.” “아니,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아무것도.”
이는 ‘원폭의 그림’에 충격을 받은 나에게나 세계 순회전에서 원폭의 그림을 관람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고요와 침묵. 하늘 높이 날아오른 연기. 먼지구름. 큰 빗방울이 하늘을 적셨다. 암흑 하늘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눈부시게 떴다. 주검. 부상한 사람들 몸엔 구더기가 꼬이고 파리떼가 윙윙거린다. 주검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흐른다. 건빵을 가슴에 안은 채 죽어간 소녀. 유리 파편이 온몸을 찔러 검은 피가 흐른다. 손목도 허벅지도 똑같은 크기로 퉁퉁 부어버렸다.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어머니, 죄송해요” 외치며 혼자만 도망쳤다고 흐느끼는 사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이 떨어뜨린 원폭으로 미군포로 23명도 함께 죽어갔다. 조선인 피폭자의 무참한 얼굴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지막까지 남은 시체들은 조선인이었다. 까마귀 무리가 날아들어 조선인 시체의 눈알을 파먹었다. 성당 위 하늘에 원폭이 작렬해 예배를 드리던 신자들과 신부님이 죽어갔다. 죽음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점점 늘어갔다. 나가사키에선 한 순간에 14만명이 스러져갔다.
인간은 세상을 사막으로 만드는 힘, 혹은 사막을 꽃피는 땅으로 만드는 힘을 애써 얻어냈다. 원자(原子) 속에는 사악함이 없다. 다만, 인간의 정신 속에 사악함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