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녕의 국립부곡병원 신경정신과 의사인 류미(37) 씨는 휠체어를 타는 의사다. 고 3때 당한 사고로 양쪽 발목에 박리성 골연골염을 얻었다. 특히 오른쪽 발목은 연골 조직이 괴사했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있다. 그는 10분 이상 서 있거나 30분 이상 걸을 수 없다. 발목에 조금만 무리가 가도 복숭아뼈에 극심한 통증이 전해진다. 세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길은 편평하지 않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자면 거치적거리는 것도 많다. 류 씨의 인생이 딱 그랬다. 문턱에 걸린 적도, 돌아가야 한 적도 많았다. 연세대 의생활학과 중퇴. 서울대 불문과 졸업 후 3년간 경향신문에서 편집기자 생활을 하다 수능 준비. 의대 낙방 이후 가톨릭대 의대 편입, 그리고 두 차례 모교 인턴 탈락과 숱한 레지던트 낙방까지. 신경정신과 의사를 꿈꾸던 소녀가 현재 자리에 오기까지 근 20년이 걸렸다. 먼 길을 돌고 돌아, 그는 휠체어를 탄 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다.
“하루에 2시간만 걸을 수 있다면…”
5월 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동아일보사 로비에서 류 씨와 만나기로 한 날. 나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궁금했다. 휠체어를 탔을까, 목발을 짚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서 있을까. 회사 로비를 한창 기웃거리다 로비 한편의 의자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다. 하얀 얼굴에 아담한 키,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이었다. 억세고 다부진 인상은 아니었다.
“의자와 엘리베이터. 어딜 가든 딱 발견해요. 생존을 위해, 이건 거의 초감각적인 것 같아요.”
덤덤하게 이야기하며 그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잔을 부탁했다. “왜 오늘은 휠체어를 타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한 10분 정도는 참고 걸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지하 3층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딱 동선이 예측되잖아요. 이럴 땐 휠체어가 오히려 불편하죠. 시선도 많이 받고요.”
그의 통증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생활 속 장애는 다양하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모든 상황이 내게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버스나 지하철에 좌석이 없어 서 있거나, 택시 정류장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 병원이 있는 부곡에서 서울 집까지 오려면 운전을 해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 4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으니 운전을 교대로 해줄 사람과 꼭 동행해야 한다. 그러니 서울 한 번 오기도 쉽지 않다.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사야 할 물건과 동선을 파악한 뒤 재빠르게 물건을 담아온다. 무엇보다 불편한 건 운동을 못하는 점이다.
“나이가 먹으면서 나잇살이 찌잖아요. 게다가 몸이 무거워질수록 발목에 부담을 더 주니까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걷기, 등산같이 서서 하는 운동은 하나도 못하니까 결국 식이요법만으로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최근 3개월 동안 5㎏을 감량했다고 귀띔했다. 오후 6시 이후 샐러드만 먹고 그 좋아하는 빵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배가 고플 때마다 ‘하루에 딱 두 시간씩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했다.
“스티비 원더가 말했잖아요. ‘내 평생 단 15분이라도 눈을 떠서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저 역시 늘 같은 마음이에요.”
궁즉통
감기에만 걸려도 집에 가 쉬고 싶은 게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으로 뛰쳐나갔다. 고3, 가장 절박할 때 ‘그 사고’를 당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고 싶지 않은 듯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공부를 꽤 잘해 의대에 진학해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성적은 점점 곤두박질쳤다. 결국 의대에 가기엔 성적이 모자랐다. 성적에 맞춰 연세대 의생활학과에 진학했지만 재미없는 공부를 견딜 수 없었다. 결국 1년간 재수 끝에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했다. 서울대 캠퍼스는 관악산 중턱에 있어 보통 사람도 걸어 다니면 숨이 찬다. 그런 곳에서 4년간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는 “궁즉통(窮卽通·궁하면 즉 통한다)”이라는 말로 답을 시작했다.
“수강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게 강의실 동선과 주차 가능 여부였어요. 한 건물에서 수업을 몰아 들을 수 있게 계획하고 차를 타고 빠져나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수업을 빠지고요. 어차피 저는 1등이 아니라 완주가 목표였으니까.”
그렇게 4년간 휠체어, 한 번 안 타고, 목발 한 번 안 짚고 그는 학교를 마쳤다.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상태를 털어놓지 않았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떨어져 지낸 가족들과도 다리 상태에 대해 얘기해본 적 없다. 왜 먼저 장애를 말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누구한테 말한다고 대신 아파주는 건 아니니까요.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저 때문에 분위기가 불편해지는 건 싫었어요.”
졸업 후 취직자리를 알아보다 ‘중앙일보 기자직 시험에는 성적증명서와 기사 작성만 본다’는 사실을 알고 대뜸 지원했다. 최종단계까지 갔으나 마지막 과제 ‘등산’이 발목을 잡았다. 당연히 시험에 떨어졌고 석 달간 공부 끝에 그는 경향신문 편집기자로 입사했다. 짧은 기자생활, 그는 “불만도 만족도 아닌 상태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지루해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는 하루도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미련 없이 사표를 냈다. 그리고 수능시험에 도전했다. 어릴 적 꿈대로 의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6개월간 수능을 준비했지만 결국 낙방. 실망했지만 여기서 다시, ‘궁즉통’이었다.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의대 중에서도 편입생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가톨릭대 의대는 매해 10명씩 편입생을 받는데 학점, 영어, 논술로만 편입생을 뽑았어요. 저 같은 문과생도 응시가 가능했던 거죠.”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는 가톨릭의대 본과 1학년으로 입학했다. 문과생으로서는 유일한 합격자였고 합격자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낯선 공부가 어렵지 않았느냐”는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딜 가나 공부 잘하면서 남을 잘 도와주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전 나이도 많고, 그런 애들이랑 친해져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전 1등할 생각이 없었어요”라고 덧붙였다.
“의대생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한 학년 100명 중 10명은 매년 유급을 해요. 유급을 면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알고 ‘저공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유급만 면하자’는 거예요.”
본과 3년을 무사히 마치고 모교에서 병원 실습을 시작했다. 매번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찌어찌해서 잘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잘되지 않을까 낙관했던 그에게 첫 번째 난관이 나타났다. 바로 회진이었다. 교수를 따라 병동을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는 발목의 통증 때문에 걷지도 서지도 못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회진 중간에 화장실에 숨어 있다 끝날 때 슬쩍 합류하는 식으로 지나갔다.
하지만 실습 중 수술실에 서서 교수의 수술 보조를 해야 할 때는 어떤 꼼수도 쓸 수 없었다. 10분 넘게 서 있자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발목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밀려들었다. ‘이러다 수술 환자에게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다. 결국 그는 수술실에서 쫓겨났다. 교수는 그의 등에 대고 “너보다 외팔이가 낫다”고 소리쳤다.
저조한 성적이지만 어쨌든 실습을 마친 그는 의사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손에 쥐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 기간 2년과 레지던트 3년만이 남은 상황. 하지만 그는 그해 모교 인턴 모집에서 떨어졌다. 통상 본교 출신 인턴 채용은 합격률이 99%에 달한다. 가톨릭대에서 모교 출신이 본교 인턴 모집에 떨어진 것은 전무후무한 결과였다.
결국 후기 인턴 모집에서 합격했지만 아픈 발목 때문에 한 달 만에 사표를 냈다. 다시 한 번 모교 인턴에 지원했지만 또 실패. 류 씨는 당시를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로 회상했다. 끝없이 절망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3전4기. 마침내 한 병원에서 그를 인턴으로 받아줬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핸디캡’을 받아들였다. 난생처음 남 앞에서 휠체어를 타기로 한 것이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인 주괄 원장과의 만남이 결정적 계기였다. 주 원장은 의료사고 때문에 후천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의사다.
“너보다 외팔이가 낫다”
“주 원장님 병원을 찾아갔더니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고 계셨어요. 분만 등은 못하지만 대부분 치료를 하시고, 단골 환자들도 주 원장님의 장애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였어요. ‘의사도 휠체어를 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묻고 싶었다. 왜 몸이 성치 않으면서 처음부터 목발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걸까? 그는 “내가 아프고 장애가 있다는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저는 아무리 아파도 휠체어 생각은 못했어요. 오히려 ‘나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왜 휠체어를 타?’ 하고 생각했죠.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고, 스스로 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진짜 의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애를 알리고 휠체어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결심했죠. 그랬더니 편해지더라고요.”
그는 휠체어에 이내 익숙해졌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대신 휠체어를 타고 더 빨리 환자에게 가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다. 환자들은 처음 류 씨의 모습에 놀랐고, 혹자는 아픈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껄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다. 오히려 “저 사람도 아픔이 있으니 내 아픔을 더 잘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였다. 18명 중 18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이었지만, 그는 끝내 인턴 생활을 마쳤다. 그리고 몇 차례 도전 끝에 정신과 레지던트가 됐다.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며 회사를 박치고 나온 후, 그 꿈을 이루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대구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국립부곡병원. 그는 그곳에서 머물며 총 스무명 남짓한 입원환자를 돌본다. 동선이 뻔한 병원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 최대한 무리가 안 되게 병실까지 걸어가 환자 침대에 걸터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환자들은 그에게 선뜻 제 공간을 내어줬다. 식사는 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이처럼 일상적인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와 환자는 ‘한편’이 된다.
“2년 전인가요, 한 젊은 여 환자가 자살 시도를 하고 입원했어요. 심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치료한 끝에 지난해 퇴원했고, 지금은 한 장애인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본인도 정신장애인이면서 다른 신체장애인들을 돕는대요. 얼마 전 만났더니 ‘환자들이 은행 갈 때 더 잘 도와주려면 운전면허를 따야겠어요’ 하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보행의 자유는 잃었지만 이곳에서 사람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 사람 여행
고3 때 막연한 꿈이 실현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왜 그는 그토록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물론 몸이 불편하니까 타협점을 찾은 거기도 하지만, 본래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신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이드 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토록 먼 길을 돌아왔으면서 또다시 새로운 일이라니. 그가 말을 이었다.
“정신과 레지던트 2년차를 마치니까, 또 이 일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저는 한 방에 승부내는 걸 좋아하는데 정신병은 치료하는 데 참 오래 걸리거든요. 이 일을 평생 해야겠다는 결심 대신 ‘또 어디 재밌는 일 없나’ 기웃거리게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그가 설레는 얼굴로 대답한다.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 야구선수의 ‘멘탈 코치’가 되는 건 어떨까 고민 중이란다. 또한 요즘 중고교생 상담에도 관심이 간다고 한다. 인터뷰 직전에도 파주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을 만나고 왔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전하며 그 역시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정신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참 오래 아프시거든요. 나아지기보다는 병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히는 게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 어린 중학생의 경우 제 말 한마디, 처방 하나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승부사 기질에 맞는 것 같아요.”
“철이 없어 미처 결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그는 늘‘발목’에 발목 잡혔으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장애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 강조한다.
“제 장애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힘드시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시겠어요’ 하고 물어요. 그런데 웬만한 건 다 하거든요. 전 술도 잘 먹고 놀러 잘 다니고 휠체어 타고 해외여행도 다녀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장애를 뜻하는 단어로 ‘불가능한(disabled)’을 쓰면 미개인 취급해요. 대신 ‘도전받은(challenged)’이라는 말을 쓰죠. 제게 장애는 평생 안고 갈 도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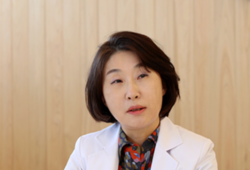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