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팜스프링은 겨울이 되면 온통 축제의 도시로 변한다. 고급 식당, 카페, 쇼핑센터, 극장, 공원, 온천 등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한낮의 온도가 40℃를 웃도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초로 접어들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30만∼40만이던 인구가 3만 정도로 줄어든다.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1937년에 만들어 세계적으로 대히트한 로맨틱한 공상영화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의 촬영지가 이곳이며, 1988년 리 트레비노가 PGA WEST 스타디움 17번홀 파3에서 멋진 홀인원 장면을 연출해 스킨스 게임의 승자가 된 곳도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내게 팜스프링은 낭만과 환상의 도시로 기억된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2시간30분 정도 달리면 팜스프링 초입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부터 사막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멀리 해발 2700m의 붉은 바위산인 산자신토(San Jacinto) 정상은 흰눈으로 덮여 있고, 산위로 케이블카가 분주히 오르내린다. 도로 양쪽 언덕엔 흰색으로 채색된 2000여 개의 풍력발전기가 북쪽 샌디에이고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받아 날갯짓을 하고 있다. 일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역동적인 프로펠러를 보면 마치 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시내로 접어드니 도로 양쪽에 하늘을 찌를 듯한 팜트리 수백그루가 늘어서 있고, 화단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아름다움을 다투기라도 하듯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보행로는 조깅을 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사막 속 오아시스의 절경
팜스프링에는 300개가 넘는 호텔과 80여 개의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퍼블릭코스도 있지만, 대부분 리조트단지에 속한 것이어서 관리가 잘되어 있고 잘 가꾼 정원처럼 아름답다. 그중에서도 라퀸타 리조트 지역에 있는 6개 골프장이 명문 코스.
1986년 피터 다이가 설계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어렵다는 스타디움 코스, 1987년 개장해 라이더컵(Ryder Cup)을 연 잭 니클라우스 프라이빗 코스, PGA 자격 파이널 테스트 코스로 유명한 토너먼트 코스, 스코틀랜드 링크스 코스를 본떠 만든 톰 웨스코프 프라이빗 코스, 주변 경치가 가장 아름답다는 그렉 노먼 코스, 매년 밥 호프 클래식이 개최되는 아놀드 파머 코스 등 6개 코스는 저마다 독특한 풍경과 코스 디자인을 자랑한다. 팜스프링을 방문한 골퍼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라운드하기를 원하지만, 스타디움 코스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행히 미국인 친구의 초대를 받아 절경의 아놀드 파머 코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다. 파72에 블랙티 기준 거리 6590야드인 이 골프장은 2001년 오픈한 신흥 코스로 5개의 대형 연못과 200여 개의 평탄한 벙커로 인해 초보자로부터 프로골퍼에 이르기까지 인기가 높다.

팜스프링 초입 도로 양쪽 언덕에 2000여 개의 풍력발전기가 해풍을 받아 날갯짓을 하는 광경이 마치 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드디어 사막의 에메랄드빛 하늘을 향해 힘차게 티샷을 날렸다. 공기가 맑고 공해가 없는 탓에 쭉 뻗어 날아가는 공이 봄날 보리밭 위를 나는 종달새처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무려 250야드에 이르는 비거리에 놀란 기색을 하자 동반한 미국 친구가 “여기는 건조하고 밀도가 낮아 다른 곳보다 평균 20∼30m는 더 나아간다”고 귀띔해준다.
8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향해 세컨드 샷을 하니 공은 낙하와 동시에 스핀이 걸려 뒤로 조금 구르다 정지한다. 발밑을 보니 골프채에 패어 떨어져나간 잔디가 한 삽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얼른 모래통을 꺼내 보토(補土)를 했다. 그린은 관리가 잘돼 있어 공이 워낙 잘 구르는 탓에 스리 퍼트, 포 퍼트는 보통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라운드를 즐기는데 미국인 친구가 갑자기 “우리들은 지금 인생의 몇 홀쯤에 와 있을까” 하고 물었다. “글쎄, 나야 13번 홀쯤 온 거 아닐까” 하고 대답하며 친구의 얼굴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더 뚜렷해져 주름도 많아 보였고 눈꼬리도 많이 처져 있었다.
의사인 친구는 “일주일에 세 번씩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느라 신경도 많이 쓰고, 법적 소송도 자주 생기고, 가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심신이 피로하다”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자기는 16번 홀쯤 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골프장 인근에 집을 사서 죽을 때까지 원 없이 골프나 치면 좋겠다”는 행복한 푸념(?)을 하기도 했다. 인간은 흐르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고, 그 어떤 직업을 가져도 고통과 애환이 없을 수는 없나 보다.
팜스프링 사막 골프장 라운드를 통해 버뮤다 잔디의 페어웨이와 러프 속에서 어프로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고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했다. 우리나라 코스에서처럼 공이 떠 있지 않고 페어웨이에 붙어 있을 때는 반드시 찍어 쳐야 한다는 것, 40∼60야드 거리의 어프로치는 샌드웨지보다는 피칭으로 치는 것이 실수할 확률이 낮다는 것,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는 라이가 여간 좋지 않고는 3번 우드를 잡지 말고 5번이나 7번 우드로 쳐야 실수가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막 지역에도 그린의 브레이크가 있으니 이를 잘 관찰하지 않고는 퍼트의 범실이 잦다는 것, 심한 러프 속에 공이 박혀 있을 때에는 샌드웨지나 피칭웨지를 써서 우선 공을 밖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린 주변에서 공을 굴릴 수 있다면 웨지 대신 퍼터를 써야 안전하다는 것 등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기술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으로는 라운드 도중에 OB나 슬라이스가 나서 공이 숲 속이나 자갈밭으로 들어가도 절대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 무시무시한 방울뱀이나 전갈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긴장의 연속 18번 홀
이 코스에서 특히 유명한 홀은 18번 홀(543야드 파5)이다. 티잉 그라운드로부터 그린에 이르기까지 왼쪽으로 물을 끼고 도는 코스인데, 경치에 매료될 여유가 없는 긴장의 연속이다. 왼쪽 워터 해저드를 의식해 오른쪽으로 겨냥하다 경사진 언덕에 공이 멈추면 세컨드 샷을 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워터 해저드에 공이 빠져도 좋다는 각오로 왼쪽을 향해 치는 것이 요령 아닌 요령이다.
서드 샷의 경우 그린이 길고 좁아 그린 위에 공을 올려놓기가 만만치 않다. 그린 앞에는 워터 해저드, 옆쪽으로는 벙커가 있어 차라리 한 클럽 길게 치는 것이 요령이다. 어렵게 스리온이 되어도 투 퍼트로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

골프장 연못엔 거위떼가 몰려들어 뒤뚱거리고 골프공이 물에 떨어지면 1000여 마리가 넘는 물닭들이 놀라 일시에 비상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클럽하우스 식당으로 들어가니 골퍼들로 왁자하다. 모두 백인이고 동양인은 나 혼자인 것 같다. 기억에 남을 라운드의 여운을 되새기며 와인을 한잔 하는데, 친구가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인즉 여름에는 온도가 살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잔디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하느라 4개월 동안 골퍼들로부터 받는 그린피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하다 못해 올해부터 멤버들로부터 연회비를 받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나니 200달러의 그린피가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팜스프링의 모든 골프장은 겨울에는 붐비지만 여름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그린피를 30달러까지 내려 고객을 유치하려 하지만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 더워 일사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고 나선 아침 일찍 골프 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친구가 클럽하우스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온 골퍼를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했다. “스포츠 강국이요, IT 선진국 한국을 위해 건배!” 하는 친구의 외침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나라가 잘돼야지 어디에 가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실감했다.
골프장을 떠나 호텔로 향하는 양쪽 거리에는 휘황찬란한 네온과 불빛이 팜스프링의 밤을 수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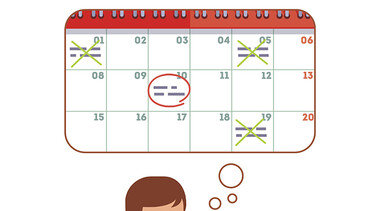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