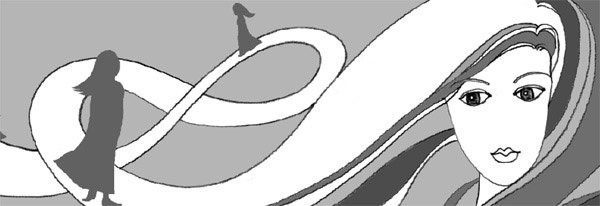
그럼에도 내가 그 다방을 좋아했던 것은, 우선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도장을 찍듯이 다방에 들러 50원짜리 홍차 한 잔을 마시고 하루종일 들락날락해도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아예 책가방을 다방에 두고 수업에 들어갔다가 수업이 비는 시간에 다방으로 돌아와 음악을 듣고, 그러다 또 다시 수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루를 보냈다. 말하자면 이삭은 내 대학생활의 거점이었던 셈이다.
내가 그 다방을 좋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손님의 취향에 ‘야합’하지 않는, 우직할 정도로 초라한 실내 분위기 때문이었다. 주인 입장에서야 내부를 장식할 돈이 없어 실내를 방치해두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이삭의 초라한 분위기를 좋아하게 된 데에는 당시 ‘문화의 산실’이라 일컬어지던 ‘학림다방’의 영향이 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유명하다는 서울대 문리대 앞 학림다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고교시절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실내 분위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여고 시절 내내 그려온 학림다방은 지극히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갖춘 곳이었다. 벽에는 유명 음악가들의 연주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한 가득 걸려 있고, 음악이 흐를 때면 연주자만큼이나 멋지게 생긴 DJ가 음악의 제목과 작품번호, 연주자의 이름을 칠판에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다음 바람같이 유리상자 안으로 사라지는 곳…. 대학에 가면 학림다방에 꼭 한번 가보겠노라며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아, 이런! 어둠침침하고 초라하며 다소 허무주의적인 냄새마저 풍기는 학림다방은 그토록 오랜 나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했다. 그때 그 기분이란….
하지만 나는 실망을 곧 자부심으로 바꾸어버렸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의 산실이란 모름지기 얄팍한 상업주의를 거부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야무지게 합리화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학림다방이나 이삭 같은 곳이 진정 ‘클래시컬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벼락부자의 깔끔한 살롱보다는 고뇌하는 예술가의 초라한 공간이 내 취향에 훨씬 맞는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마음껏 그 시절의 철없는 허영을 즐겼다.
아침 일찍 이삭의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를 때, 다방 안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던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차 나르는 아가씨에게 ‘음대생이 이 곡의 제목도 모르냐’며 핀잔을 들었던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누군가가 탁자 위에 가사를 적어놓았던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 나는 이러한 음악들과 더불어 꿈 같은 대학생활의 전반부를 보냈다.
당시 이삭에 출근하는 대학생은 나말고도 여럿 있었다.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클래식 애호가들이었는데,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예술과 문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되면 근처 선술집으로 달려가 연탄불 위에 올려놓은 찌개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곤 했다. 어쩌면 그때 우리가 나누던 대화는 삼류철학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이답게 지향하는 이상이 있었고, 대단히 진지했었다.
이삭에 자주 드나들던 대학생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몸이 삐쩍 마르고 얼굴빛이 하얗던 그 대학생에게는 뭔지 모를 신기(神氣) 같은 것이 느껴졌다. 친구로부터 그가 다방에서 베토벤의 ‘운명’에 맞추어 지휘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좀처럼 그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다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드디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듣던 대로 베토벤의 ‘운명’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다방 한구석에서 신들린 듯 지휘를 하고 있었다. 마치 자기 앞에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기라도 한 듯, 그는 손님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휘에만 열중했다. 얼마나 열심히 ‘운명’을 들었는지 각각의 악기가 나올 차례에 정확히 신호를 주는 것이 한두 달 연습한 솜씨가 아니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나는 멋지다기보다는 처절하다는 느낌에 목이 콱 막혀왔다. 그저 젊은 날의 치기로 웃어넘길 수 없는 처절한 목마름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토록 음악에 열중하게 만들었을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음악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자가 베토벤의 ‘운명’을 4악장까지 지휘하겠다고 죽기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시험공부를 하듯이 죽기살기로 외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살기로 지휘를 감행한 것. 그 상황이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랬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그렇게 처절하게, 죽기살기로 문학과 예술에 열중했다.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예술 나부랭이를 배우고 즐길 여유조차 없던 시절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콤플렉스를 기필코 극복해보겠다는 야심만만한 각오로 그렇게 한풀이를 했던 것이다.
음악을 전공한 나는 비교적 형편이 나은 편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음악전공자로서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에 다니는 것조차 버거운 내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 그저 목숨같이 소중한 음악을 죽기살기로 짝사랑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음악을 듣는 일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소위 ‘운동권 학생’이 되었던 것이다. 그후 이삭에서 사귀던 순수파와도, 그들과 함께 듣던 클래식 음악과도 결별을 고한 채 나는 ‘클래식을 즐기는 것은 나이브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하는 이른바 참여파와 어울렸다. 오페라 아리아 대신 당대 유일의 앙가주망 음악이었던 운동가요를 부르며 대학생활의 후반부를 보낸 것이다. 그때 나의 감성과 나를 둘러싼 현실 사이에서 몹시 힘들어했던 기억이 난다.
클래식에 목숨을 걸었던 대학생활의 1막과,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대학생활의 2막. 완전히 상반된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세계 사이에는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세월 좋은’ 시절에는 볼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음악이란 목숨 걸고 들어야 하는 것도, 목숨 걸고 듣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시절은 항상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정말 세월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다면 목숨 걸고 음악을 들을 필요도, 또 목숨 걸고 음악을 외면할 필요도 없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행복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천상 요즘 아이들인 내 딸들을 보면서 나는 이 질문을 마치 화두(話頭)처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