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고등학교 전경과 인촌 김성수 동상.
광복 이후 1970년대 중반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때까지 세칭 5대 명문 공립(公立) 고교로는 경기·서울·경복·용산·경동고등학교가, 5대 명문 사학(私學)으로는 중앙·휘문·보성·양정·배제고등학교가 꼽혔다. 이들 학교들은 저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이끈 엘리트 집단을 양성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이후 이들 중 상당수는 교육 여건이 더 나은 강남으로 학교를 이전했다. 공립 중에선 경기고와 서울고가 강남으로 옮겨갔고, 사학 중 지금도 강북에 남아 있는 학교는 중앙고등학교가 유일하다.
바로 그 중앙고등학교가 올해 6월로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중앙 100년사(史)’는 국권(國權)을 상실한 일제(日帝) 강점기부터 광복과 6·25전쟁, 경제발전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욕(榮辱)이 엇갈렸던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 3·1운동, 6·10만세운동 등 중요한 고비마다 중앙학교의 인물들이 있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중앙 출신들의 자긍심(自矜心)의 원천이 되고 있다. 중앙의 전통에 씨앗을 뿌리고 키운 인물들과 그들에 얽힌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개교 100년을 맞는 중앙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 유일한 민족 민립(民立) 교육기관으로 출발중앙학교의 역사는 1908년 1월 경기도·충청도 출신의 우국지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로부터 비롯됐다. 당시는 을사늑약(乙巳勒約·1905) 체결로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던 시절이었다. 민족 선각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능한 일은 신교육, 신문화의 계몽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실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저런 학회와 학교를 조직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었다.
기호흥학회는 같은 해 6월 신문에 학생모집 광고를 내고 ‘기호학교’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6월20일 한성 북부 소격동 학회 건물에서 열린 개교식에는 입학생 90명과 함께 수많은 학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일부 뜻있는 인사들의 출연금(出捐金)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호학교는 1910년 9월 융희(隆熙)학교와 합병한다. 융희학교는 개화선각자 유길준(兪吉濬) 선생이 주축이 되어 1907년에 조직된 흥사단(興士團)이 세운 학교인데, 두 학교 모두 경영난으로 존속이 여의치 않게 되자 합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1월 호남(湖南)학회, 교남(嶠南)교육회, 관동(關東)학회도 기호흥학회와 합쳐져 중앙학회로 개칭(改稱)하고, 학교 이름도 ‘사립중앙학교’로 바꾸었다.
“중앙학교는 한 개인이 사재(私財)를 털어 만든 사립학교도 아니고, 외국인이 선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도 아니다. 민족 선각자들의 모금(募金)으로 세워진 특별한 학교다. 학교 설립을 위해 전국의 민족지도자와 지역 단위 학회들이 하나로 뭉친 예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학교가 유일하다.”
학교 태동기의 역사와 관련한 중앙교우회(中央校友會) 측의 설명이다.
# 인촌(仁村)의 중앙학교 재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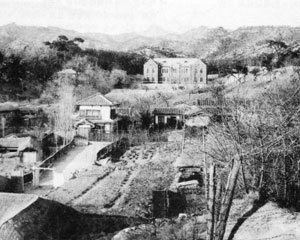
초가집과 일본식 집들이 뒤섞여 있는 계동 끝에 우뚝 솟은 신식 교사. 1917년 12월 준공했으나 1934년 12월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됐다.
학교는 설립됐지만 교실 부족으로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교직원 봉급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 계속됐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에도 학교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강했다. 중앙학회는 1913년 11월 총회를 열어 중앙학교를 인계할 대상을 물색하기로 결정했다.
1915년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선생이 구원자로 떠올랐다. 당시 인촌은 6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24세의 젊은이였다. 인촌은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에 유학할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일본이 짧은 기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에 있으며, 그런 만큼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 독립을 이루어내려면 교육사업에 힘써야 한다는 자각(自覺)이 있었다.
애당초 인촌이 설립하려고 했던 학교의 교명(校名)은 ‘백산(白山)학교’였다. 그러나 학교를 직접 세우려던 인촌의 꿈은 일제 총독부의 불허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고, 대신 1915년 4월 중앙학교를 인수하게 된다. 인촌은 이를 위해 양부(養父)인 원파(圓坡) 김기중(金祺中) 공과 생부(生父)인 지산(芝山) 김경중(金暻中) 공을 설득해 허락을 얻어냈다.
중앙학교는 비로소 반석 위에 놓이게 되었다. 1917년 3월 교장에 취임한 인촌은 그해 6월에 현 위치인 종로구 계동 1번지에 학교부지 4311평을 매입했다. 11월에는 건평 120여 평의 2층 건물을 낙성해 12월에 학교를 이전했다.
# 중앙학교와 3·1운동초창기 중앙학교의 교장 사택은 새로 지은 교사 앞 운동장의 동남편 구석에 있었다. 조그만 기와집으로 오늘날에는 화강암 석조 대강당이 있는 터였다. 지금은 다른 곳에 옮겨서 옛날의 교장 사택을 복원했고, 원래 자리에는 ‘3·1운동 책원지(策源址)라는 기념비가 서 있다.
1918년 12월 인촌과 일본 유학시절부터 평생지기이자 중앙학교 교장인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그리고 중앙학교 교사였던 기당(幾堂) 현상윤(玄相允), 세 사람은 거의 매일 교장 사택에 모였다. 이 해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 원칙인 14개 조항의 하나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를 제창했다.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결 원칙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식민지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일제 압박에 신음하던 조선민족에게도 일대 서광이었다.
이해 워싱턴과 상하이, 도쿄 등지에서 독립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인촌과 고하, 기당 세 사람은 교장 사택에서 국내에서 벌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했다. 세 사람은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천도교와 기독교계의 합작(合作)을 주선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듬해인 1919년 3월1일, 3·1독립운동이 폭발했다. 중앙학교의 조그만 교장 사택이 거대한 민족운동의 산실이 된 것이다.
물론 인촌과 고하, 기당 세 사람이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전계획에 따라 2선에서 운동을 지원하고 1선에서 희생되는 인사들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고하와 기당은 중앙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주(校主)인 인촌이 전면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만류했다. 1910년 일제는 ‘105인 사건’을 조작해 조선의 우국인사 및 독립운동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됐던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선생이 설립한 대성(大成)학교도 폐교됐다. 고하와 기당이 3·1운동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내 인촌을 보호한 것은 이처럼 민족교육기관인 중앙학교가 문을 닫는 비극을 막기 위함이었다.
중앙학교 학생들은 3·1운동에 적극 참가했다.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시작된 시위는 물론 3월5일 남대문역 광장에서 시작된 서울의 제2차 시위에도 전교생이 참가했다. 그 후 서울과 지방에서 몇 달 동안 계속된 시위에서 검거된 중앙학교 학생들은 확인된 수만도 30여 명에 달했다. 결국 3월 중에 열려야 할 이해 졸업식도 치를 수 없었다.
# 인촌에 얽힌 일화들1993년에 중앙교우회가 발간한 ‘중앙80년사(中央八十年史)’에는 인촌에 얽힌 일화가 여럿 소개돼 있다. 하나같이 민족주의 정신을 드높이고 일제에 도전하는 중앙학교의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무명교복중앙학교를 인수한 후 인촌은 학생들의 옷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 하찮은 걸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시오?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그냥 입히면 되는 거지.”
보다 못한 안재홍(安在鴻) 선생이 이렇게 말하자 인촌은 고개를 흔들었다.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니오. 학교 모자와 학교 옷은 바로 그 학교의 얼굴이며 상징입니다. 관립 일본학교마냥 일제 광목으로 된 옷을 입히고 그들이 씌운 모자를 그대로 씌울 수는 없는 일이오. 조선학생은 조선학생 티가 나야지요.”
고심하던 인촌은 검은 천을 댄 교모(校帽)에 무명으로 지은 교복을 입히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질 좋고 맵시 나는 일제 광목을 두고 왜 하필이면 손으로 짠 그 투박한 무명베로 교복을 하느냐며 못마땅해 했다. 광목은 개화 이후 일본 상인들이 들고 들어와 가장 재미를 본 생필품이었고 널리 판을 치고 있었다.
“값싸고 질긴 우리 전래의 무명베가 있는데 왜 비싼 일제 광목을 쓴단 말이오? 우리가 우리 것을 쓰지 않으면 누가 쓴단 말이오?”
인촌은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장려’나 ‘국산품 애용’은 구국운동의 하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찮은 교복에까지 신경을 쓴 것은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만이라도 그러한 민족의 얼을 심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자랑스러운 중앙인’ 역대 수상자 명단 | 제1회(1988) | 인촌 김성수, 고하 송진우, 기당 현상윤, 월봉 한기악, 관산 조철호, 이선호·이동환·박용규·유면희(이상 18회) |
| 제2회(1989) | 동산 윤치영(7회), 일석 이희승(9회), 도산유수 정문기(9회), 탕안 서항석(9회) |
| 제3회(1990) | 춘강 조동식(1회), 심강 고재욱(12회), 백릉 채만식(13회), 동은 김용완(13회) |
| 제4회(1991) | 이종우(16회), 조홍제(17회), 김상만(21회), 김용식(22회), 심형필(전 교장) |
| 제5회(1992) | 국채표(16회), 이성범(25회), 정인회(25회) |
| 제6회(1993) | 변영로(6회), 최복현(17회), 윤택중(24회) |
| 제7회(1994) | 이우주(27회), 김봉은(30회), 나운영(30회) |
| 제8회(1995) | 이을호(20회), 이용희(25회), 신도성(26회) |
| 제9회(1996) | 백남규(8회. 전 모교 교사) |
| 제10회(1997) | 이혜복(32회), 변영태(전 모교 교사), 유경상(전 모교 교사) |
| 제11회(1998) | 김태현(33회), 채문식(34회) |
| 제12회(1999) | 윤한식(40회), 신영훈(46회) |
| 제13회(2000) | 김각중(33회), 김찬국(36회), 정진석(41회), 김병관(45회) |
| 제14회(2001) | 이원종(33회), 이철배(40회), 박병호(41회) |
| 제15회(2002) | 김창현(36회), 이웅희(40회), 박성용(41회), 민대홍(43회) |
| 제16회(2003) | 조중건(42회), 이상혁(44회), 김학수(47회), 문일평(전 모교 교사) |
| 제17회(2004) | 한만년(34회) |
| 제18회(2005) | 최창락(41회), 김상기(전 모교 교사) |
| 제19회(2006) | 고희동(전 모교 교사), 김수진(48회), 박승희(10회), 석일균(37회), 이기문(40회), 주종훈(2회), 지석영(기호학회 초대 부회장) |
| 제20회(2007) | 정중렬(46회), 김완진(41회), 차하순(41회), 이재기(30회), 송응섭(47회), 최불암(본명 최영한·49회), 이백천(42회), 민경배(43회), 최규식(38회), 한동관(49회), 이인혁(44회), 안병표(48회), 조성옥(41회), 여운홍(3회), 안재홍, 백관수, 최두선, 최순주(9회), 류홍(11회), 리병도, 최남선, 리윤재, 권덕규, 최규익, 윤효정, 박승봉, 유성준, 윤치오, 유길준, 권병덕, 남궁훈, 유근, 함상훈(12회), 이병준(31회), 한종건 (12회), 김영환, 이종우, 주재경(19회), 이희준(8회), 서정주, 리상화, 마해송, 김기팔(본명 김용남 49회), 한진희, 박명진(16회), 구인회, 권오설, 권오상, 림규, 남영희(18회), 유진태, 송내호(6회), 임유동, 이병우(9회), 권원하, 조옥현, 강대성, 심홍택, 남상갑 |
| ‘설립공로자’ | 김윤식, 남궁억, 서병철, 이희직, 고정주, 리하영, 김기중, 김경중, 장현식, 박용희, 김년수, 이용직 |
| 21회(2008) | 전항섭(17회), 강창거(20회), 이기을(33회), 이태로(41회), 이곤(42회), 홍인근(45회), 임광규(48회), 전세권(48회), 소칠섭(49회), 최청림(50회), 신문수(50회), 이준상(52회), 남궁진(52회), 김병일(55회), 이광환(58회), 정몽준(61회), 서정호(62회), 장지영(본교 교사) |
2. 참성단(塹星壇) 수학여행 -유홍(柳鴻) 전 국회의원(11회) 회고

중앙고 교내에 있는 3·1기념관.
“나는 1916년 인촌 선생께서 학교를 인수하신 다음 해에 중앙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첫 소풍을 강화도로 갔는데 그때의 일은 오래도록 나에게 어떤 충격처럼 남아 있었다. 전교생이 함께 갔던 것 같다.
유근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 중에는 물론 인촌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에 올라갔다. 교장 선생님은 이 단군 성터에서 학생들에게 단군설화를 얘기하면서 목이 메었으며, 인촌 선생님께서도 소리 없이 눈물을 짓고 있었다. 학생들도 그제서야 나룻배까지 빌려 타고 강화도에 소풍을 온 까닭을 깨닫고는 모두 함께 울었다. 그때 교장 선생님 바로 옆에서 단정한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리시던 인촌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3. 인촌의 수업시간 - 신도성(愼道晟) 전 국토통일원 장관(26회) 회고
“인촌은 수신시간에 교재를 뒤로 제쳐놓고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은근히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었다. (…) 3·1운동 때의 말씀도 하셨는데 중앙학교에서 모의하던 얘기를 하셨다. ‘3·1운동이 파고다공원에서 일어난 줄만 알고 있지? 사실은 중앙학교에서 시작된 거야. 계획도 세우고 유인물도 만들고 그랬는데 바로 그거 한 집이 바로 저 집이야!’ 하고 우리 학교 숙직실을 가리켜주셨다. 이렇게 인촌 선생은 중앙학교가 민족주의의 본거지임을 일깨워주셨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4. 퇴교생들이 모이는 곳 - 서항석(徐恒錫) 연출가(9회) 회고
“나는 1918년에 중앙학교를 졸업했는데 따지고 보면 1년도 못 다니고 졸업한 셈이다. 나는 보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여 중앙학교로 편입학하게 됐던 것이다. 인촌 선생의 항일적이며 애국적인 용단을 잊을 수가 없다.
보성학교 2학년에서 문제가 생겼다. 체조시간이 되어 모두 웃옷을 벗고 나가게 되었다. 물론 교실에는 당번이 지키게 돼 있었다. 그런데 벗어두었던 옷 속에서 시계가 없어졌던 것이다. 마침 보성학교에는 ‘고마쓰자키’라는 일본인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종로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그래서 형사가 와서는 학생들을 죄인 다루듯했다. 우리는 4학년으로 최고 학년이었는데, 이 같은 사태에 크게 분개했다. (…) 사태가 커질 것 같아 2, 3학년들을 누르고 우리 4학년 학생 8명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교장선생께 자퇴서를 냈다. 교장인 최린(崔린) 선생은 만류하셨지만 우리의 기세는 당당했다. 최린 선생은 안 되겠던지 인촌 선생께 전화를 거셨다.
‘요새 우리 학교 사건 생긴 거 아시지요? 정말 진퇴유곡입니다. 총독부에서 퇴학을 시키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 퇴학을 시켰소만 정말 우수한 애들인데 가슴이 아프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애들의 장래를 막아놓을 수는 없지 않소?’
‘좋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퇴교생 전원을 저희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소생이 맡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학교로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후에 생각하니 인촌 선생의 애국자로서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었다.”
5. 일본말 대답에 매질한 영어 선생 - 채문식(蔡汶植) 전 국회의장(34회) 회고
“1930년대 말 일제는 국어상용이라 하여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쓰게 했다. (…) 그러나 당시 이 땅에서 오직 한 곳, 중앙고보만은 일본어를 쓰지 않았다. 그 시절에 일본어를 쓰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대개 중앙학교 선생은 1년은 학교에 계시고, 1년은 감옥에 가 계시는 게 보통이었다.
중앙학교에 입학하면서 매를 많이 맞았다. 입학 첫날부터 영어시간에는 회초리 하나씩을 집에서 준비해오라는데 집에 갈 때에는 그게 다 꺾일 지경이었다. 출석을 부르는데 선생님은 우리말로 ‘채문식!’ 하고 부른다. 그때 초등학교에서는 일본어만 배웠으므로 부지불식간에 ‘하이!’라고 대답하게 되고 그렇게 ‘하이!’라고 하면 또 맞는 것이었다. 물론 선생님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자기가 가져간 회초리가 다 부러질 때쯤 되면 뭔가 가슴에 뿌듯한 게 있어서 ‘예’라고 우리말로 대답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촌이 계신 중앙이 아니면 안 됐다.”
윤시탁 중앙고 교장 인터뷰
“재학생 학력 신장이 제1의 목표”
| 지난해 3월 제27대 교장에 취임한 윤시탁(尹始鐸) 교장은 학교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주인공이다. 취임 직후 밤 10~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실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재학생의 학력 증진이다. 재단이 많은 투자를 해주어 학교시설은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만큼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개혁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다.”
▼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김병관(金柄琯) 전 이사장께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온 사안이다. 2000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와 재단이 힘을 합해 많은 준비를 했다.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려면 먼저 그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 학교로서는 기숙사를 마련해야 하고,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 100주년 기념행사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나.
“지난 3월에는 모교 100주년 체육관에서 3·1운동기념식 및 3·1운동 책원기념행사가 열렸고, 한국보이스카우트 발상지비 건립식도 가졌다. 6월10일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 6·10 만세운동 기념식과 함께 독립운동가 명예졸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고, 20일에는 100주년 기념식 및 모교 출신인 서정주 시비(詩碑), 이상화 시비(詩碑), 채만식 문학비, 교가비 건립 제막식 등이 개최된다. 이 밖에 올 연말까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윤 교장은 “우선 강북에서 1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히 홍보가 된다”며 “2010년부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허용되면 강남에 사는 교우들이 자제를 모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력 신장과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
# 한국 보이스카우트 운동의 발상지세계 보이스카우트 운동은 1907년 영국에서 육군중장 바덴 포웰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학교가 그 발상지다. 1922년 10월 중앙학교 교사였던 관산(冠山) 조철호(趙喆鎬) 선생이 학생 8명과 함께 결성한 ‘조선소년군’이 그 모태가 됐다. 관산은 학교 뒤편 계산(桂山) 언덕을 무대로 학생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너희는 이 민족의 화랑이다. 민족을 구하는 선봉이 돼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일제는 이마저도 내버려두지 않았다. 소년군의 명칭에서부터 단가(團歌)와 행진가에 내포된 사상이 항일 독립사상의 고취이며 불온한 결사라고 단정한 일제는 해산을 종용했고, 조선소년군은 끝내 1937년 가을에 해체되는 비운을 겪었다.
# 6·10 만세운동의 주동3·1운동 후 쇠미해가는 듯하던 독립정신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불을 지핀 학생운동이 1926년 6·10 만세운동이다. 이 운동의 주축 또한 중앙학교 학생들이었다. 순종황제의 인산일(因山日)에 발발한 6·10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사회주의 운동주체인 노동계의 권오설과 권도상이 중앙 출신이었고, 중앙학교 학생이던 이동환, 박용규, 이선호, 류면희 등을 포함해 모두 11명이었다.
거사 날 대여(大輿)가 종로 3가를 지날 때 그곳에 있던 이선호, 이동환 등이 만세를 선창하며 격문과 선전문을 살포하자 학생들과 군중이 합세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의 파도는 돈화문 앞까지 전해지고 관수교에 있던 연희전문 학생에게도 이어졌다. 중앙기독교청년회관 학생들은 을지로 5가 부근에서, 경성제대 예과 학생들은 훈련원 봉결식장 뒤에서, 중동학교 학생들은 동대문 밖 동묘 뒤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거사로 중앙학교 학생 100여 명과 연희전문 학생 79~80명, 기타 학생 수십명이 체포돼 종로서로 압송됐다.
6·10 만세운동은 배후에 조종자나 지도자가 없었고 순전히 피 끓는 학생들이 우국충정에서 일으킨 독립운동으로 3·1운동의 연장이요, 광주학생운동의 전도가 되었다.
백순지 중앙교우회장 인터뷰
“21세기 명문사학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일 다 하겠다”
| 백순지 중앙교우회장(54회 졸업·백순지치과의원 원장)은 요즘 본업보다도 모교 일로 더 바쁘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중앙 100주년 기념행사가 바로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25년 전부터 야구후원회, 장학재단 등 모교 사업에 적극 관여해온 그는 교우회 사무총장에 이어 2004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 모교에 대해 자랑할 게 많겠지만, 여타 명문교와 구별되는 차이를 하나만 든다면 어떤 것인가.
“민족의식이 누구 못지않게 강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애국지사가 모교를 설립하고 또 그 정신을 본받아 독립운동의 산실이 된 점이다. 그런 탓인지 중앙 출신 중 공직에 몸담았던 인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야당 계열의 학교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우리 졸업생 중 예컨대 의료 계통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 있건 우리 중앙 졸업생들은 인촌 선생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 중앙 출신 중에 우리 현대사를 주도한 인물이 참 많은데.
“맞다. 우리 학교 역사와 졸업생 명단이 그대로 근현대사의 전모를 보여준다고 할 정도다. 이번에 교우회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0년사’등 5종의 책을 발행하는데, 그중 ‘인물로 본 중앙 100년’에 들어갈 인물이 너무 많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은 이를 위해 1988년부터 매년 ‘자랑스러운 중앙인’을 선정해오고 있는데도 그렇다.”
▼ 하지만 자랑스러운 역사에 비해 최근엔 좀 어려움을 겪는 듯하다.
“평준화 이후 우수학생 유치가 어려워져서 그렇다.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교우회에서 1990년대 중반에 ‘종합고등학교’안을 재단에 건의한 일도 있다. 4개 계열별로 영재를 모집해 교육하자는 안이었는데,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그 후 2000년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하기도 했다.
우리 학교가 교사(校舍) 등 하드웨어 면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면에서의 보완인데, 교우회와 재단, 학교가 모두 한뜻인만큼 앞으로 잘되리라고 본다.”
▼ 100주년을 기해 교우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100억원을 목표로 시작한 100주년 기금 모금운동도 그중 하나다. 지금까지 동창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만 25억 정도인데, 앞으로 목표가 채워지면 이 중 70%를 모교발전기금으로 쓸 예정이다. 이 외에 재단에 맡겨온 34억원의 중앙학교 운영기금이 불어나 64억 정도가 있다.”
백 회장은 기존의 운영기금 64억에 대해 사연이 있는 돈이라고 소개했다. 고교 평준화 이후 학교가 재정난에 처했다. 이에 교우회가 나서 모금운동을 펼쳐 3억8000만원을 모았는데 이 사실을 안 박정희 전 대통령이 2억원을 희사했다고 한다. 이것을 종잣돈 삼아 김봉은 전 교우회장(작고·30회)이 잘 운용해 64억원 이라는 거금이 됐다는 것이다.
▼ 재단 측과 협조는 잘 되고 있나.
“지난 2월 작고하신 화정(化汀) 김병관(金柄琯) 전 재단이사장(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께서 중앙학교를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 2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얼마 전에 마무리된 학교 리모델링 작업만 해도 화정 선생이 아니었다면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다.
화정 선생은 병고에 시달리던 마지막 순간까지 중앙학교를 사랑했던 분이다. 지난해 9월 어느 일요일이었는데 내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분을 우연히 뵌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분은 투병 중에도 간호사를 대동하고 교정을 둘러보며 개선할 사항을 글로 써서 비서에게 전달하고 계셨다. 화정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중앙학교를 21세기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
|
# 1990년대 이후의 중앙고등학교고교평준화 이후 중앙고등학교의 웅장한 교세(校勢)도 한풀 꺾인 감이 없지 않다. 물론 민족주의를 드높인 빛나는 전통의 빛이 바랠 리야 없겠지만, 강남에 비해 강북이 낙후한 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탓이다.
다른 명문 사학들은 강남으로 학교를 옮겨갔지만, 중앙은 그러기도 어려웠다. 서관(사적 282호), 동관(사적 283호), 현재의 본관(사적 281호) 등 학교 건물 상당수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얄팍한 세태를 좇아 항일 민족운동의 보루 역할을 했던 종로구 계동 터를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은 1995년 종합고등학교안(案), 2000년에는 자립형 사립고안(案)을 검토했다. 강북지역에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국내 고교로는 처음으로 거금을 들여 컨설팅 회사에 학교현황 분석을 맡기고, 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2000년대에 들어와 학교는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변화를 도모했다. 재단 측은 100주년 기념관으로 2005년 12월 정보과학관, 2006년 2월에는 체육관을 완공한 데 이어 기존 교사(校舍)도 모두 리모델링했다. 올해 2월에는 인조 잔디구장 개장식도 가졌다. 이로써 중앙고등학교는 국내 고교는 물론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됐다. 전통과 첨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배움의 전당, 현재의 중앙고등학교 모습이다.
각계에 포진한 중앙 교우(校友)들
(중앙교우에는 중앙 중·고 졸업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된다.) | ▼ 정·관계
▶정계(政界)◀
* 김종인(49회)=민주당 17대 비례대표. 11,12,14대 국회의원
* 박성범(50회)=한나라당 17대 서울 중구 국회의원
* 정몽준(61회)=한나라당 최고위원, FIFA 부회장 겸 올림픽조직위원장
* 유일호(중앙중 62회)=한나라당 18대 당선자
▶관계(官界)‘국장급 이상’◀
* 정중렬(46회)=평안남도지사
* 김문원(52회)=의정부 시장
* 장동환(59회)=국토해양부 용산공원추진기획단 부단장 파견/국무총리실 소속
* 김주일(60회)=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 본부장
* 최광식(62회)=국립중앙박물관장
* 조청원(63회)=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 고정식(64회)=특허청장
* 이동훈(64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심윤조(64회)=외교통상부 본부, 오스트리아 대사
* 김종훈(64회)=법무부 인권국장, 외교통상부 출신
* 김경수(64회)=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 조태열(65회)=외교통상부 본부, 대사 발령 예정
* 손성환(65회)=미국 시카고 총영사
* 안양호(66회)=경기도 행정부지사
* 장기원(66회)=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 이재영(66회)=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문하영(66회)=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전 우즈베키스탄 대사
* 이창한(66회)=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최종현(66회)=외교통상부 정보상황실장
* 이인근(66회)=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안현호(67회)=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 김배홍(67회)=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 이호철(67회)=기획재정부 부산지방조달청장
* 이기철(67회)=외교통상부 영사심의관
* 황순택(67회)=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심의관
* 김주현(68회)=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법조계
* 우제(愚齊) 김태현(金兌鉉·33회)=전 대법관
* 이상혁(李相赫·44회)=동아일보와 모교 재단 상담역
* 심훈종(沈勳鍾·47회)=전 서울형사지법 부장 판사
* 정기용(鄭基用·47회)=전 육군 법무감(준장)
* 임광규(林炚圭·48회)=‘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회장
* 안동수(安東洙·50회)=전 인천지검 검사. 2001년 법무부장관
* 권오봉(權五鳳·59회)=현 부산지법 가정지원장
* 심학무(沈學茂·61회)=전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장흥경찰서장. 1993년 개업
* 김 섭(金 燮·61회)=부산·대구 지검 검사를 거쳐 1991년 개업
* 조승곤(趙承坤·61회)=전 군산지원장·서울지법 부장판사
* 김동재(金東宰·61회)=변호사로 광주지역에서 활동
* 이윤승(李胤承·62회)=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 북부지원장. 현 가정법원장
* 강신원(姜信源·62회)=변호사, 강릉에서 활동 중
* 권오곤(權五坤·63회)=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 윤승진(尹勝鎭·63회)=전 진주지원장·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개업
* 조용호(趙龍鎬·64회)=서울고법 판사
* 권진웅(權鎭雄·64회)=전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강서 변호사
* 정진우(64회)=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국제변호사
* 양동철(梁東哲·65회)=전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개업
* 채정석(蔡晶錫·65회)=한화그룹 법무담당 부사장. 행정·사법 양과 합격
* 임정혁(林正赫·66회)=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현 울산지검 차장 검사
* 김동윤(金東潤·66회)=전 서울 중앙지법 판사
* 민창환(閔昌煥·66회)=예금보험공사·보험소비자연맹 변호사
* 박용식(朴鏞軾·66회)=법무법인 우성종합 변호사
* 엄도희(嚴道熙·66회)=변호사
* 서우정(徐宇正·66회)=전 서울고검 검사, 삼성그룹 법무실 부사장
* 조문성(趙文誠·66회)=미국 변호사, 김&장 변호사
* 강영호(姜永虎·67회)=서울고법 부장판사
* 김상도(金相道·67회)=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 송재양(宋在洋·67회)=법무법인 서광 대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오연균(吳沇均·67회)=건교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근무
* 이문호(李文鎬·67회)=변호사,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장
* 장태규(張太圭·67회)=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
* 조소현(曺沼鉉·67회)=로서브 변호사, 인천 유나이티드FC 고문변호사
* 조선환(趙璇煥·67회)=법무법인 ‘사랑’ 변호사
* 강병국(姜炳國·67회)=변호사, 전 경향신문 기자
(68회 이하 생략)
▼ 종교계
* 김찬국(金燦國·36회)=연세대 교수, 목사. 전 상지대 총장
* 정진석(鄭鎭奭·41회)=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민경배(閔庚培·43회)=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백석대 석좌교수
▼ 재계
* 조중건(趙重建·42회)=전 KAL 부회장
* 이인혁(李仁爀·44회)=선진종축 그룹 회장
* 왕기주(王基周·54회)=대현농수산 사장
* 이원태(李元泰·55회)=금호고속 대표이사 사장
* 김종호(金鍾浩·57회)=아시아나 아이디티 사장
* 김영철(金榮哲·57회)=동국제강 사장
* 한형석(韓炯錫·58회)=마니커 대표이사 회장
* 정몽준(鄭夢準·61회)=현대중공업 고문
* 허진수(許進秀·63회)=GS칼텍스정유 사장
* 장세주(張世宙·63회)=동국제강 회장
* 정몽윤(鄭夢允·64회)=현대해상화재 회장
* 정몽선(鄭夢善·64회)=현대시멘트 회장
* 김량(金亮·65회)=삼양제넥스 대표이사
* 권은영(權殷榮·66회)=동명중공업 대표이사
* 구자균(具滋均·67회)=LG 산전사장
* 구본걸(具本杰·67회)=LG패션 대표이사
* 허태수(許兌秀·67회)=LG 홈쇼핑 사장
* 김원(金沅·68회)=삼양사 대표이사
* 김양(金瀁·68회)=현대시멘트 부사장
▶제약업계◀
* 이철배(李哲培·40회·1926~2007)=대웅제약 전 사장, 명예회장
* 정지석(鄭之碩·51회)=한미약품 부회장
* 김영진(金寧珍·66회)=한독약품 회장
* 백승호(白承浩·66회)=대원제약 대표이사
* 김원규(金元圭·67회)=삼성제약 대표이사
* 윤재승(尹在勝·72회)=대웅제약 부회장, 변호사
▶전문경영인◀
* 최홍린(崔洪鱗·41회)=고합 전 사장
* 이기동(李起東·41회)=선경화학 전 사장·부회장
* 조항구(趙恒九·45회)=삼부토건 전 대표, 비상임 고문
* 백남진(白南珍·49회)=경방 전 부사장·사장, 현재 고문
* 김영휘(金英輝·49회)=삼성중공업 전 전무, 스타벅스 사장
* 김정순(金正淳·49회·1939~2004)=제일제당 사장, 삼성 라이온스 회장
* 김주용(金柱瑢·49회)=현대전자 전 사장, 고려산업개발 전 사장
* 이대원(李大遠·50회)=제일모직·삼성건설·삼성자동차·삼성항공 전 대표이사
* 채수삼(蔡洙三·52회)=금강기획 전 사장, 서울신문 전 사장, 현 그레이프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 이철우(李哲雨·52회)=전 롯데마트 대표, 롯데쇼핑 대표이사
* 이수호(61회)=현대중공업 부사장
* 조국필(趙國弼·57회)=(주)쌍용 대표이사
* 이해진(李海鎭·58회)=삼성BP화학 사장, 전 삼성사회봉사단 초대단장
* 한순현(韓舜鉉·59회)=보르네오가구 사장
* 이필승(李弼承·60회)=전 대림산업 이사, 풍림산업 사장
* 조용권(趙容權·60회)=한국파파존스 사장
* 정만원(鄭萬源·61회)=SK네트워크 사장
* 송문섭(宋文燮·61회)=전 펜택&큐리텔 회장, 유니스타컴 총괄 사장
* 박동훈(朴東勳·62회)=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 조진욱(趙鎭旭·62회)=BASF 회장
* 김양수(金良洙·62회)=벽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최재신(崔在臣·63회)=고려개발 대표이사 사장
* 이민화(李珉和·63회)=메디슨 상임고문
* 정이만(鄭二萬·63회)=63시티 사장
* 신용호(愼鏞浩·63회)=금강제화 대표이사
* 전세호(全世鎬·66회)=심텍 회장
* 길현창(吉炫昌·67회)=모토로라 코리아 사장
* 백정호(白正鎬·68회)=동성화학 사장
▼ 금융계 보험업 등
* 이동훈(李東勳·57회)=제일화재보험 회장
* 강정원(姜正元·중앙중 57회)=국민은행장
* 정용화(鄭庸和·62회)=국민은행 감사
* 김주윤(62회)=SC 제일은행 e서비스부 상무
* 하영구(河永求·중앙중 60회)=씨티은행장
* 이철휘(李哲徽·중앙중 60회)=자산관리공사 사장
* 김명기(64회)=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 조일래(64회)=한국은행 법규실장
* 윤용로(尹庸老·65회)=중소기업은행장
* 이강만(65회)=하나금융지주 부사장
* 임주환(65회)=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 이정원(66회)=신한은행 부행장보
* 황서광(黃瑞光·66회)=흥국쌍용화재보험 대표이사
* 고정석(67회)=일신창업투자 대표이사
▼ 언론계(광복 이후를 위주로)
* 이웅희(李雄熙·40회)=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문공부장관, 13·14·15대 국회의원
* 백승호(白承胡·41회)=전 내외경제 편집국
* 오병열(吳炳烈·42회)=한국일보 기자, 전 소년부 차장
* 홍인근(洪仁根·45회)=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고려중앙학원 상담역
* 정덕교(鄭德敎·45회)=중앙일보 기자, 사회부 부장대우. 현재 한솔 PCS 감사
* 주명갑(朱明甲·47회)=중앙일보 편집국장, 세계일보 편집국장
▶49회 언론인들◀
* 공종원(孔鍾源)=중앙일보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 송선무(宋善武)=경향신문 특집기획부장, 서울방송 심의위원
* 최택만(崔澤萬)=서울신문 경제부장· 외신부장 대우, 논설위원
* 조광식(趙光植)=동아일보 사회부장, MBC 스포츠국장, LG 축구단장. 축구협회 홍보위원장, 현 한국체육언론인회 부회장
* 민광성(閔光成)=KBS 정치부·경제부 기자, 한화그룹 홍보실 이사
▶50회 언론인들◀
* 박경진(朴京鎭)=조선일보 기자, 2002 월드컵조직위홍보실장
* 송충섭(宋忠燮)=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판매국장, 전경련 이사,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 사무국장, 메인컴 회장
* 최청림(崔靑林)=전 조선일보 편집국장·논설위원 이사
* 조연흥(曺然興)=조선일보 사회부장, 전무이사. 현재 독립기념관 이사
* 김도진(金道鎭)=KBS 보도국장, 방송연수원장. 미래교육방송 대표,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회장
* 박인순(朴仁淳)=한국일보 논설위원. 대통령공보비서실 비서관,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사장, 언론중재위 부위원장
* 조강환(曺康煥)=동아일보 논설위원, 방송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정책개발원 원장, 생활경제TV 공동대표이사
* 박성범(朴成範)=KBS 앵커, 보도본부장. 15·17대 서울 중구 국회의원
* 정규웅(鄭奎雄·51회)= 중앙일보 문화부장, 중앙경제 편집국장대리, 논설위원
* 고학용(高學用·52회)=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현 언론중재위 독자불만처리위원장
* 채수삼(52회)=서울신문 사장
* 정 훈(丁 薰·53회)=한국일보 외신부장, 서울경제 논설위원
* 이운학(李雲鶴·53회)=KH 새마을 편집장, 내외경제 산업부 차장
* 김진수(58회)=매일경제 인터넷 부사장
* 백화종(59회)=국민일보 편집인, 전 주필
* 권일(60회)=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정보사업단대표
* 이명구(60회)=KBS 심의팀장
* 방민준(60회)=한국일보 전 논설위원실장
* 강일중(61회)=연합뉴스 심의위원
* 이정욱(61회)=디지털타임스 전 사장
* 김석규(62회)=전 월간조선 이사
* 양홍모(62회)=KBS 심의위원, 전 통일부장
* 양봉진(62회)=한경닷컴 전 사장, INFINITE 전 대표
* 김형배(63회)=한겨레 논설위원
* 황창호(64회)=연합뉴스 심의위원
* 김성희(64회)=중앙일보 고려대파견, 전 문화부장
* 김상수(65회)=MBC 해설위원
* 이승철(66회)=경향신문 논설위원
* 최창영(66회)=MBC 워싱턴특파원
* 하남신(66회)=SBS 논설위원
* 김영규(66회)=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 이인용(67회)=전 MBC 앵커, 삼성전자 홍보팀 전무
* 임흥식(67회)=MBC 보도특집부장
(68회 이하 생략)
▼ 군(현역)
* 신보현(60회)=예비역 공군 중장. 국방대 부총장
* 공승구(61회)=정보화학교 영어교수
* 유대우(61회)=육군소장, 육군대학 총장
* 김성곤(64회)=국군정보사 위성사업단장
* 윤학수(64회)=공군소장,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본부장
* 김규천(64회)=공군대령, 주일본 대사관 무관
* 이승헌(65회)=육군대령, 육군교육사 전력소요 2처장
* 김웅건(66회)=육군대령, 레바논 파견 동명부대장
* 황진환(67회)=육군중령, 육사 정치학 과장
* 이제수(68회)=육군준장, 육본 인사운영감실 인사혁신팀
(69회 이하 생략) |
|
각계에 포진한 중앙 교우(校友)들
(중앙교우에는 중앙 중·고 졸업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된다.) | ▼ 학계
* 이희승(9회)=국어학자, 서울대 명예교수, 전 동아일보 사장
* 정문기(9회)=어류학자
* 국채표(16회)=기상학자
* 김잉석(金芿石·17회)=불교학자, 전 동국대 불교대학장
* 이을호(20회)=동양철학자
* 하기락(河岐洛·24회)=철학자, 무정부주의 이론가
* 이용희(25회)=정치학자, 국내 최초 미술사학자‘3·1운동 대표 이갑성씨 아들’
* 이 양(李 梁·25회)=공학자
* 박홍규(朴洪奎·31회)=철학자, 서울대 철학과 교수
* 윤세원(尹世元·31회)=물리학자
* 정병조(鄭炳祖·31회)=영문학자
* 이기을(李氣乙·33회)=경영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 김소인(金素麟·35회)=화학자
* 최계근(崔桂根·35회)=전자 분야 학술원 회원
* 윤한식(40회)=섬유공학자, 세계 최초 방탄섬유 개발, 한국과학한림원 회원 KIST 전 석좌연구원, 지난 1월24일 별세
* 김상기(金庠基)=모교 교사. 동양사학자
* 문일평(文一平)=모교 교사, 언론인이자 역사학자
* 이기문(李基文·40회)=국어학자
* 김완진(金完鎭·41회)=국어학자, 서울대 명예교수, 국어학회장
* 박병호(朴秉濠·41회)=법제사학자,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 이병도(李丙燾)=사학자. 모교 교사. 서울대 교수, 문교부장관, 학술원 회장
* 최남선(崔南善)=모교 교사, 역사학자이자 시인, 중앙고 교가 작사자
* 이윤재(李允宰)=모교 교사, 국어학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사
* 이태규(李泰圭)=화학자, 국내 최초 이학박사
* 한배호(韓培浩·41회)=정치학자
* 차하순(車河淳·41회)=서양사학자. 서강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 이태로(李泰魯·41회)=조세 및 회사법 학자. 서울대 명예교수
* 조윤제(趙潤濟)=모교 교사. 국어학자
* 유봉철(劉奉哲·41회)=경제학자
* 최문형(崔文衡·43회)=역사학자
* 김수진(金洙鎭·48회)=지질학자
* 소칠섭(蘇七燮·49회)=지질학자
* 한우근(韓퍑劤·모교 교사)=국사학자
* 김열규(金烈圭)=모교 교사, 국문학자, 서강대 교수
* 손진태(孫晉泰)=모교 중퇴, 역사학자
* 김선기(金善琪)=모교 중퇴, 국어학자
* 주시경(周時經)=모교 교사, 국어학자
* 김우용(金寓龍·52회)=언론학자, 외대 명예교수
* 권길헌(61회)=한국과학기술원 응용수학과 교수
* 이중화(李重華)=모교 교사, 수학자
* 권덕규(權悳奎)=모교 교사,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
* 손호철(孫浩哲·61회)=서강대 정외과 교수
* 유기춘(65회)=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김경화(67회)=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정덕균(68회)=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 교육계
* 이재기(李在幾·30회)=상명대 재단이사장
* 박양원(朴良元·32회)=전 경희대 총장
* 조성옥(41회)=전 인하대 총장, 문교부 차관
* 김중순(48회)=한국디지털대학교 총장
* 나종일(羅鍾一·59회)=우석대 총장. 전 주일대사
* 김병철(金炳喆·59회)=고려대 부총장
* 유병진(61회)=명지대 총장
▼ 의료계
* 박명진(朴明鎭·16회·1903~1958)=서울대 치과대학장, 재산 전부를 대한치과의학협회에 기증
* 이우주(李宇柱·27회)=약리학자, 연세대 의료원장, 연세대 7·8대 총장
* 최규식(崔奎植·38회)=해정의료재단 이사장
* 이원종(33회)=청주 삼화이비인후과의원 원장
* 김주완(38회)=방사선과,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 남상혁(41회)=남상혁 외과의원장
* 이부영(42회)=신경정신과, 서울의대 명예교수, 한국융(Jung)연구원장
* 민진식(47회)=외과종양학 전공, 송도병원장, 전 대한암협회장
* 한동관(韓東觀·49회)=현 관동대·총장. 영동세브란스 병원장, 관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권혁수(51회)=경희한의대, 민생한의원장
* 이준상(李駿商·52회)=고려대 의대 교수, 한국의료법학회장, 전 국립보건원장
* 송경섭(53회)=경희한의대, 경희명한의원장
* 백순지(54회)=서울치대, 백순지치과위원장. 현 중앙고 교우회장
* 장영일(54회)=치과교정학 전공, 현 서울치대 병원장
* 이규완(56회)=고려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 교수, 산부인과내시경학회장
* 김여갑(57회)=전 경희대 치대 학장·치과병원장
* 최득린(58회)=순천향대병원 방사선과 의사
* 강기서(59회)=중앙대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 정규형(61회)=인천한길병원 이사장, 2007년 제19회 아산상 대상 수상
* 정준기(62회)=서울의대 핵의학과 과장
* 조양혁(62회)=가톨릭의대 생리학 교실 주임교수
* 김우경(63회)=고려의대 구로병원 성형외과장
* 장영운(64회)=경희의대 소화기내과 과장
* 노만희(65회)=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백제병원장
* 김명환(66회)=서울아산병원 담석센터 소장
▼ 문인
▶시인◀
* 이상화(10회·1901~1943)=‘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 미당 서정주(未堂 徐廷柱·25회·1915~2000)
* 수주 변영로(樹州 卞榮魯·3회·1897~1961)
* 포석 조명희(抱石 趙明熙·1894~1938)=시인이자 소설가
* 월하 김달진(月下 金達鎭·1907~1989)=중앙고보 중퇴
* 월북작가 정호승(1916~?)=중앙고보 자퇴
* 모더니스트 시인 배인철(裵仁哲·31회·1920~1947)
* 기형도(1962~1989·70회)=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로 등단
* 조병준(1960~·70회)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
* 백릉 채만식(白綾 蔡萬植·13회·1902~1950)
* 월북 문학평론가 김동석(金東錫·24회·1913~?)
* 소설가 김용익(金溶益·30회·1920~1995)
* 소설가 김정한(金廷漢·1908~1996)=중앙고보 중퇴 후 동래고보 졸업
* 아동문학가 마해송(馬海松·1905~1966)
* 연출가 서항석(徐恒錫·9회·1900~1985)
* 극작가 박승희(朴勝喜·10회·1901~1964)
* 방송작가 김기팔(金起八·본명 김용남·49회)
* 문학평론가 김치수(金治洙·50회)
* 시인 겸 문학평론가 이수화(李秀和·51회)
* 남궁원(본명 홍경일·43회)=영화배우
* 이백천(李白川·42회) 방송 PD, 음악평론가
* 전세권(全世權·48회)=연출가. 전 동양방송 TV 프로듀서
* 최불암(49회)=탤런트
* 장 우(52회·본명 장경진) 팝·재즈계의 거장
* 하명중(56회·본명 하명종)=영화배우, 감독
* 고영수(61회)=개그맨의 원조, 방송인
* 김창완(62회)=가수. 그룹 ‘산울림’ 리더
* 박건형(87회)=뮤지컬 배우
* 김철민(94회)=개그맨, MBC 출연
▼ 음악계
* 김병규(金秉奎·37회)=작곡가, 목원대·청주대 교수, 청주시립 교향악단 지휘자.
* 김대붕(金大鵬·41회)=작곡가, 성심여대 음대 교수, 전 중앙고 음악교사
* 조민구(趙珉九·42회·플루트)=LA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 조정현(曺廷鉉·42회·바순)=서울시향 전 수석단원, 한국바순협회 명예회장
* 김영대(金永大·42회·색소폰)=경음악 발전에 헌신
* 최영삼(崔濚三·42회·호른)=전 서울시향 단원 , 김학태(金學泰·47회·색소폰)
* 이순택(李淳澤·48회·비올라)=전 서울시향 단원
* 박인채(朴仁埰·48회·드럼)=‘섬드리 합창단’ 단장, 전 KBS PD
* 민춘기(閔椿基·53회·플루트)=전 MBC 경음악단장
* 전성일(全誠一·53회·더블베이스)=전 서울시향 단원, 첼로의 거장 전봉초 아들
* 신홍균(申弘均·53회·플루트) 상명여대 음악학과 교수
* 이존성(李存誠·54회·클라리넷)
* 전동혁(全東爀·55회·호른)=전 시향단원·롯데월드 음악 담당. 한국예총 부회장
* 이종환(李鍾桓·55회·트롬본)
* 정영웅(丁永雄·55회·트럼펫)
* 이우천(李遇千·56회·트럼펫)=시애틀교회 목사
* 이순희(李淳熙·56회)=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 김종환(金宗煥·중앙중 57회·타악기)=KBS교향악단 단원
* 박상연(朴商演·64회·비올리스트)=‘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대표 겸 음악감독
* 장민수(張敏洙·65회·바이올리니스트) 미국 템플대 음대 교수
* 황종석(黃宗奭·66회·클라리넷)=한국클라리넷협회 부회장
* 김용환(金容煥·67회·피아노) 한세대 음악학부장
* 박용호(朴鎔鎬·69회·플루트)=광주대 겸임 교수
* 김남진(金南鎭·71회·더블베이스)=청주시향 단원
▼ 미술계
* 유준상(劉俊相·42회)=전 ‘현대미술’ 편집장,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 이양원(李良元·중앙중 50회)=동덕여대 회화과 교수, 전 예술대학장
* 이건걸(李建傑·43회·1933~2005)=청전 이상범의 넷째 아들. 상명여대 교수
* 구자승(具滋勝·51회)=전 상명여대 교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최준원(崔俊元·62회)=진주예고 교사, 목원대 강사, 현재 모교 미술교사
▶화가들◀
* 손두옥(孫斗沃·41회)=서양화가, 국제화우회 이사
* 성능경(成能慶·54회)=서양화가
* 홍용남(洪龍男·52회)
* 장석봉(張錫奉·60회)
* 김명식(金明植·68회)
* 박기룡(朴基龍·73회) 향상공간미술학원장
* 조병철(曺秉喆·73회)
* 조구희(趙九熙·74회) 21세기청년작가회 상임위원
* 김형무(金亨茂·74회)
* 이택희(李宅熙·73회)
▶서예가◀
* 백아 김창현(白牙 金彰顯·35회)=모교 한문 교사.
(형이 일중 김충현(一中 金忠顯), 동생이 바로 여초 김응현(如初 金應顯))
* 이 곤(李 坤·42회)=한글 서예가, 현재 사단법인 한국서학회 이사장
* 신문수(申文壽·50회)=만화가
* 심정수(沈貞秀·51회)=조각가
* 윤동구(尹同求·61회)=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조교수
▶디자인 분야◀
* 김정필(金禎弼·58회)=조선대 미술대 디자인학부 교수
* 류가용(柳嘉鎔·59회)=현 목원대 디자인학부 교수
* 여홍구(呂弘九·60회)=국내 1세대 에디토리얼 다지이너
* 박천일(朴天一·62회)=경희사이버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 신현장(申鉉章·56회)=패션 디자이너. 재단법인 국제패션연구진흥원 이사장
* 윤진호(尹鎭虎·59회)=산업 디자인 박사, 건국대 대학원 교수
* 이대일(李大一·61회)=명지대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 김 면(金 勉·66회)=성균관대 예술학부 디자인과 교수
* 이성표(李聖杓·68회)=일러스트레이터
* 김명환(金明煥·69회)=현재 계원조형예술대 전시학과 교수
* 김영배(金榮培·71회)=신성대학 산업디자인 계열 교수
▶건축가◀
* 정인국(鄭寅國·26회)=조흥은행 본점 및 마포아파트 설계자. 홍익대 대학원장
* 강기세(47회)=범 건축 회장
* 신영훈(48회)=고건축 전문가
* 박영건(56회)=범 건축 대표
▼ 체육계
* 한진희(韓軫熙·모교 교사)=유도인, 일제시대 조선씨름협회 창립
* 이광환(58회)=프로야구 우리히어로즈 감독
* 홍수환(60회)=권투선수, 전 세계주니어페더급 챔피언
* 이종도(61회)=전 고려대 야구 감독
* 최종덕(65회)=서산시민축구단 감독
* 정해성(69회)=축구국가 대표팀 수석 코치, 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 김주성(74회)=한국축구협회
* 김승희(77회)=N리그 소속 인천 한국철도팀 축구감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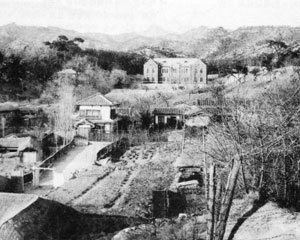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