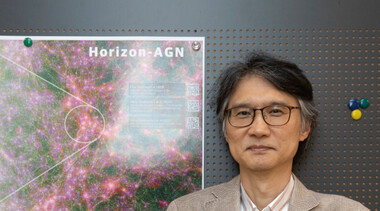![8월 7일 서울시 중구 명동의 한 편의점 옆 건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 돼있다. [전혜빈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6/be/ef/89/66beef89003cd2738276.jpg)
8월 7일 서울시 중구 명동의 한 편의점 옆 건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 돼있다. [전혜빈 기자]
경기 여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이 동네는 인구수가 적어 편의점이 더 필요 없다”며 “편의점을 시작한 2014년만 해도 여주 시내부터 가남읍 도로변까지 3~4개의 편의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20여 개나 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에 따르면 기존 편의점 50~100m 이내 신규 편의점 출점은 제한된다. 편의점 간 과당경쟁(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일반적 경쟁 범위를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하는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편의점은 해마다 늘어난다. 과당경쟁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점포수는 2021년 4만8539개, 2022년 5만2480개, 2023년 5만5580개로 매년 약 3000개씩 증가했다.
반면 대다수 자영업은 문을 닫고 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체 81만8867개 가운데 21.5%인 17만6258개가 지난해 폐업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2020년(13.41%)과 2021년(14.73%)을 웃도는 수치다. 대형마트 역시 점포수가 줄어들고 있다. 각 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전체 수는 2021년 405개, 2022년 402개, 2023년 396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약속과 달라 항의하니… “계약했으니 끝”
![8월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거리에 두 개의 편의점이 약 50m 거리를 둔 채 영업하고 있다. [전혜빈 기자]](https://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66/be/ef/bb/66beefbb2217d2738276.jpg)
8월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거리에 두 개의 편의점이 약 50m 거리를 둔 채 영업하고 있다. [전혜빈 기자]
쉬운 창업이 가능한 까닭은 본사의 ‘영업’ 덕분이다. 창업 지원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맹점을 늘리려 한다. 편의점 업계 ‘공룡’ 간 벌어지고 있는 각축전 때문이다. 특히 GS25와 CU는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CU는 점포 수와 영업이익에서 1위를, GS25는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2월 두 회사가 발표한 실적공시에 따르면 GS25의 지난해 매출은 8조2456억 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18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억 원 줄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8조1948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53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0.3% 증가했다. 양 사의 매출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엔 512억 원 차이가 났다. 2019년 9130억 원이던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양 사의 경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올해 3월 미니스톱과의 통합 작업을 완료한 세븐일레븐도 싸움의 열기를 더한다. 세븐일레븐은 이를 통해 점포수 약 1만4000개를 확보했다.
경쟁으로 인한 ‘출혈’은 점주에게 돌아간다. “개업 후엔 본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게 점주들의 말이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최병규(64) 씨는 7월 28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그는 “과거 5년 정도 타 브랜드의 편의점을 했다”며 “그때 수익은 150만 원 정도였고, 계약 당시 본사가 약속한 60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끝’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씨는 브랜드를 바꿔 편의점을 다시 열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에서 가맹 계약 제안이 온다”며 “계약 당시 다른 편의점 본사들도 일시금을 1억 원 넘게 챙겨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본사에선 ‘설령 가게를 접더라도 자리가 좋아 금방 인수자가 나타날 것이니 권리금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약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본사의 말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새 편의점에선 첫날부터 적자가 이어졌고, 최 씨는 결국 살던 집을 팔아 월셋방에 살게 됐다. 친척들에게 돈까지 꿨다. 결국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해 본사에 위약금 1억 원을 물어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본사의 주 수익원은 가맹점주”
점포 수 증가는 또 다시 점포 수 증가를 낳는다. 본사에선 경쟁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점주에게 점포를 여러 개 내게끔 한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5년 전 지금 건물의 1층과 지하에서 동시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열었다”며 “애초에 두 곳 모두에서 가게를 여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여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역시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는 “편의점을 운영한 지 3년 되던 때 맞은편 2~300m 거리에 경쟁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본사의 권유에 차라리 내가 2개를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과당경쟁에 점주가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은다. 최 씨는 “본사에서는 장사가 안 돼도 물품을 발주하라고 권유한다. 물건이 안 팔리는 데 생기는 부담은 온전히 점주가 다 떠 안는다”며 “피해는 점주들이 보고 본사는 계약서 썼으니 나 몰라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 중구 흥인동 편의점 점주 D씨는 “본사들이 경쟁하듯 점포를 늘려가서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로 인해 기존 점포의 매출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성장하지만 내실은 빈약해진다.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편의점의 전체 매출은 4.1% 증가했으나 점포당 매출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본사는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본사의 주된 수익원은 가맹비가 아니다. 상품을 점주들에게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주 수익원”이라고 말했다.


















![[영상] “‘민주당 승리 공신’ 자랑스러워하는 MBC, 말기적 증세”](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6/de/5e/48/66de5e481b45d27382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