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인재를 거느리고도 반면교사와 같은 암군(暗君)으로 전락한 선조. 전선 12척으로 적선 133척을 물리치고도 천행(天幸)이었다고 겸손해한 이순신. 위기 때 더욱 빛난 이순신 리더십의 진면목을 살펴본다.

명량해전을 재현한 행사. 이순신이 12대 133의 절대 열세 싸움에서 승리한 요인은 헌신적인 리더십이다.
“망명이 내 본뜻이다”
500년 조선 역사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은 리더는 선조일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인재가 가장 많은 시대를 열었기에 성군(聖君) 반열에 오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된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줬기에 공분을 샀다.
1592년 4월 13일, 조선 땅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연일 전해지는 패전 소식에 선조와 신하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선조수정실록’ 1592년 5월 1일에는, 4월 30일 아침 대화가 기록돼 있다. 선조가 피난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선조는 이산해와 류성룡을 부르고는 가슴을 치며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모(李某)야! 류모(柳某)야!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꺼리지도 숨기지도 말고 생각을 말해보라.”
신하들이 대답하지 않는 사이 이항복이 의주를 추천하며, “팔도가 모두 함락된다면 바로 명나라로 가서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윤두수는 전통적으로 군사력이 강했던 함경도를 추천했다. 그러자 류성룡이 “임금께서 우리 땅을 벗어나 한 발짝이라도 나간다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 말이 비수가 됐는지, 선조가 본심을 드러냈다.
“내부(內附, 명나라로 망명)가 내 본뜻이다.”
선조는 국가와 백성보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명나라로 도망치려 했다.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었다. 종묘사직과 백성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생존에만 연연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백성과 신하들에게 전란의 책임을 전가한 선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참된 리더가 이순신이다. 다음 두 장면을 보자.
#1 이순신의 조카 이분(1566∼1619)이 쓴 ‘이충무공행록’(이하 ‘행록’)의 1597년 2월 26일 상황이다.
이순신은 부산포 진격 명령을 거부해 한산도에서 체포됐다. 서울로 압송될 즈음이다. 선조처럼 도망치는 길이 아니다. 불패의 명장이 한순간에 나라의 죄인이 되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떠나고 있었다. 이순신을 본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그를 둘러싸고 “대감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라며 울부짖었다.
#2 이순신 자신의 일기다. 1597년 7월 칠천량에서 통제사 원균(元均·1540~1597)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밤중에 기습당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1551~1599)이 전투 중에 이끌고 나온 12척을 제외한 조선 수군은 전멸했다. 참혹한 사태에 직면한 이순신은 8월 3일 삼도통제사 임명장을 받고 수군 재건의 길을 나섰다.
8월 6일, 피난을 떠나는 백성들이 이순신을 만났다. 백성들은 “사또가 다시 오셨으니, 우리는 살길이 생겼습니다”라며 기뻐했다. 8월 9일 이순신이 낙안을 지나갈 때 길가에 동네 노인 등이 줄을 서 다투어 환영하고 위로하며 음식과 음료수가 든 항아리를 바쳤다. 받지 않으면 울며불며 떼를 썼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순결함
백성들이 던진 돌멩이를 맞고 욕을 먹으며 도망친 선조와 전혀 다른 처지다. 이순신은 백성에게 생명 그 자체였다. #1과 #2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또 있다.
#1이 있기 직전, 이순신은 가덕도 앞바다에 출동해 있다가 체포 명령을 듣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는 도착 즉시 진중의 군량과 무기류를 계산해 후임자인 원균에게 인계했다. ‘행록’에 따르면, 진영 안의 군량미 9914석, 화약 4000근, 전선에 비치된 총통 외 300자루 등을 인계했다. 직위가 해제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는데도 이순신은 직분에 충실했다.
‘행록’에 따르면, #2에서 이순신은 권율(權慄·1537~1599)의 요청으로 패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7월 18일 군관 9명, 군사 6명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가 옥과와 순천을 거쳐 보성에 도착했을 때 인원이 120여 명으로 불어났다. 피난을 가던 젊은이들이 이순신을 만난 뒤 가족에게 “이제 우리 대감이 오셨으니 너희들은 안 죽을 것”이라며 수군 재건의 길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잡혀가는 이순신을 보고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라고 했고,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복귀한 이순신을 보고 “우리는 살길이 생겼습니다”라고 했을까. ‘난중일기’와 ‘임진장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그것을 ‘참 진(眞)’ ‘다할 진(盡)’ ‘나아길 진(進)’으로 정리한다.
윤동주가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한 것과 똑같다.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순결함으로 묵묵히 소명을 실천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1597년 9월 15일은, 8월 3일 통제사 재임명장을 받은 이순신이 군사를 모으고 전선(戰船)을 수습하면서, 닥쳐올 대결전인 명량해전을 앞둔 날이다. 8월 18일 이순신은 회령포(會寧浦)에서 경상우수사 배설 소속의 전선 10여 척을 인수했다. 그가 한산도에 있던 4년 동안 새로 건조하고 정비한 전선이 150여 척이었는데 12척만 남았다.
이순신도 어쩔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20일부터 23일까지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토하기도 하고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을 궤멸시키기 위해 추격해 오는 일본 수군을 잊지 않았다.
神人을 만나다
지친 몸을 추스르며 그는 소수가 다수를 상대해 승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다. 회령포를 시작으로 8월 20일 이진(梨津), 24일 도괘(刀掛)를 거쳐 어란(於蘭)포로, 28일 장도(獐島), 29일 벽파진(碧波津), 9월 15일 우수영(右水營) 앞바다로 진영을 옮겼다.
이동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칠천량 패전으로 사기가 바닥인 조선 수군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하지만 이순신은 철저한 준비와 계산으로 단 한 차례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
8월 28일, 적선 8척이 기습했지만 이순신은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적선이 다가오자 나각(螺角)을 불고 깃발을 휘두르며 쫓아버리게 했다.” 9월 2일, 조선 수군 수뇌부의 일원인 배설이 도망쳤어도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9월 7일, 탐망군관(探望軍官) 임준영이 일본 전선 13척이 어란포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그는 기습에 대비했다. 오후 4시쯤 일본군이 기습했지만, 준비된 조선 수군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일본군은 그날 밤 다시 기습했으나 이를 예측한 이순신이 대장선을 이끌고 나가 지자포(地字砲)를 쏘며 격퇴했다.
9월 14일, 임준영이 “적선 200여 척 중 55척이 먼저 어란포에 들어왔다”고 보고하자 그는 결전을 예감하고 전령선(傳令船)을 보내 피난민들을 육지로 올라가도록 급히 명령을 내렸다.”
9월 15일, 이순신은 “벽파정 뒤에는 명량(鳴梁)이 있다. 적은 수의 수군으로 명량을 등 뒤에 두고 진(陣)을 칠 수 없다”며 우수영 앞바다로 이동했다. 그러고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병법에 전하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兵法云 必死則生 必生則死)’고 했다.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고 했다.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가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긴다면 곧장 군율로 다스려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이순신은 꿈에 신인(神人)을 만났다. 신인은 이순신에게 지시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저렇게 하면 패배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순신이 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전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사실은 그가 12척의 전선으로 133척의 일본군과 맞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순신이 승리를 간절하게 염원했기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배설에게 퇴로 열어줘
꿈에 신인이 나타날 정도로 승리를 열망한 이순신이지만 신인 덕분에 명량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7월 중순의 칠천량 해전 이후 10월 29일 목포 고하도(高下島)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이순신 리더십의 진면모를 알 수 있다.
명량해전 두 달 전에 쓴 7월 18일 일기에는 원수(元帥) 권율이 칠천량 패전 후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대목이 나온다. 요청을 받은 이순신은 “제가 직접 연해 지방으로 가서 듣고 본 후에 대비책을 정합시다”라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듣고 본 후에 대비책을 정하자(吾往沿海之地 聞見而定)’는 그의 말은, 중국 한(漢)나라의 명장 조충국(趙充國)이 유목민족 강(羌)의 반란 소식을 듣고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황제에게 “백 번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 번 보는 것이 낫다(百聞不如一見). 군사의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직접 가서 현지 지형을 관찰한 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순신은 솔선수범하는 위엄으로 대장선 병사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줬다.
이순신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탐망군관 임준영을 중심으로 한 정찰부대를 운용해 일본군 동향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덕분에 조선 수군은 단 한 번도 일본군의 기습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순신이 회령포에서 전선을 인수한 이후 명량해전까지, 일본군은 8월 28일 1회, 9월 7일 2회 기습해왔으나 모두 격퇴했다.
그는 한 번도 겁먹고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배설의 도망 전후 이순신이 취한 조치는 위기 때 드러나는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배설은 칠천량 해전 이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8월 25일 포작들의 헛소문에 놀라 도망쳤다가 27일에야 나타났다. 8월 30일 이순신은 전쟁공포증에 걸린 배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첫째는 그가 칠천량해전 때처럼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소속 장수들을 불러 거느렸다. 배설과 그 휘하의 장수들을 분리해 휘하 장수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배설과 함께 도망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약속 또 약속
그는 배설의 도주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이때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들추는 것이 장수의 계책이 아니기에 생각을 감추고 있었다”라고 일기에 썼다. 이순신 리더십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배설은 도망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지만, 그런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장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같은 날 이순신은 배설이 병을 핑계로 육지에 상륙해 몸조리를 하겠다고 하자 허락했다.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배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군사들에게도 시의적절한 위로를 했다. 대규모 일본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연달았기에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이 시급했다. 그는 모친상을 당한 터라 움직임을 삼가야 했지만, 마지막 전투가 될지 모를 군사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9월 9일, 소 5마리를 잡아 군사들에게 먹였다. 그런데 그날 일기에는 잔치를 하면서도 경계에 철저한 면모가 드러난다. 염탐하러 온 일본군 전선 2척을 영등포 만호 조계종(趙繼宗)이 추격해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9월 14일 임준영이 일본군 동향을 긴급 보고하자 이순신은 자신을 따라다니던 피난민들을 육지로 올라가게 해 전투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그는 승리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백성 보호책은 다른 곳에서도 눈에 띈다. ‘적을 무찌른 일을 아뢰는 계본(討賊狀)’(1593년 4월 6일)에 따르면, 이순신은 일본군이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자 적선을 모두 불태우지 않고 한두 척을 남겨뒀다. 일본군이 다시 바다로 나와 도망치게 한 것이다.
이순신은 “적선만 불태우다가는 궁지에 몰린 도적들의 화풀이(窮寇之禍)가 반드시 (산속에 피난해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혀 놓았다. 이는 ‘손자병법’에서 ‘궁지에 몰린 적을 압박하지 말라(窮寇勿迫)’고 한 대목과 관련이 있다. 이순신은 그렇게 하면서도 복병선을 배치했다. 산에서 내려와 몰래 바다로 도망치는 일본 전선에 대한 공격을 잊지 않은 것.
9월 16일, 이순신은 명량대첩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날도 미리 배치해둔 정찰군사가 일본군의 이동을 제대로 보고했다. 이순신은 그에 맞춰 “장수들을 불러 모아, 거듭 약속”을 하고 출전했다.
이순신의 말과 글에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부하들을 설득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 부하 장수들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자발적으로 움직인 이유의 하나가 바로 ‘약속’이다.
명량해전은 이순신인 탄 대장선이 맨 앞에서 외로이 첫 포성을 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런데도 부하들은 압도적인 규모의 일본군을 보자 ‘약속’을 잊고 두려워하며 전투를 회피했다. 포위된 대장선을 지켜보면서도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장선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순신은 대장선에 탄 부하 장졸들부터 설득했다. “배 위의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논하며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적이 비록 1000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는 바로 치지 못할 것이다. 조금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고 했다.”
적장을 寸斬한 이유
이순신은 물살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홀로 견뎌냈다. 전환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부하들을 불러 나각을 불게 하고 깃발을 올렸다. 거제 현령 안위, 중군장 김응함이 잇따라 다가왔다.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호통을 치고 한편으로는 설득했다.
안위에게는 “네가 명령을 거스르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가서 산들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외쳤다. 김응함에겐 “너는 중군(中軍)인데도 멀리 피해 대장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 죄를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적의 상황이 급하다. 잠시라도 먼저 공(功)을 세워라!”라고 했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도 이순신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부하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냈다. 미국 예일대 교수 이언 에어즈가 강조하는 ‘당근과 채찍’ 같은 동기부여 방식이 아니다. ‘솔선수범과 위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적진으로 들어간 안위는 안골진(安骨陣)의 적장(賊將) 마다시(馬多時)와 그 휘하의 적선 2척과 대결했다. 이순신도 합세해 적장선 등 적선 3척을 파괴했다. 이순신과 안위의 핵심 타깃은 적장선이었다. 지휘체계를 붕괴시켜 승리를 거머쥐려는 것이다.
적장선은 무력화되고 적장은 바다에 떨어졌다. 이순신의 배에 타고 있던 투항한 일본군 출신 준사(俊沙)가 바다에 빠진 마다시를 알아보고 이순신에게 보고했다. 이순신은 즉시 마다시를 건져 올리게 한 뒤 ‘촌참(寸斬)’을 명했다.
촌참은 ‘온몸의 마디마디를 잘라 죽이는 것’이다. 마다시의 온몸이 토막토막 잘렸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살인·강도·강간·탈영병을 처형하거나 효시케 한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촌참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촌참은 연산군 시대에만 나오는 악형이었다.
그런 촌참을 명령한 것은 일본군에게는 공포심과 함께 도망쳐 살고자 하는 욕망을, 조선 수군에게는 리더의 위엄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순신의 계획대로 일본군의 기세는 꺾였고, 구경만 하던 조선 수군은 거센 파도처럼 일본군 진영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날 밤, 이순신은 깃털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이번 일은 실로 하늘이 도우셨구나(此實天幸), 하늘이 도우셨구나(天幸天幸)…”라며 하늘에 감사했다. 다음은 인간 이순신, 리더 이순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일기 몇 대목이다. 리더를 꿈꾸는 이라면 한 번쯤 새겨볼 만하다.
△1595년 1월 1일. 맑았다.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았다. 나랏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또 80세의 아프신 어머니 걱정에, 애 태우며 밤을 새웠다.
△1597년 10월 16일. 맑았다. (…) 내일이면 막내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나흘째이다. 그런데도 마음껏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을 수 없어, 소금 굽는 사람(鹽干) 강막지의 집으로 갔다.
|
△1594년 2월 9일. 맑았다. 고성 현감에게 당항포에 적선이 왕래하는지 물었다. 또한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서로 죽여 잡아먹는 참담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1597년 10월 21일. 밤 2시쯤에 비와 눈이 오락가락했다. 바람결이 아주 차가웠다. 뱃사람들이 추워 얼어붙을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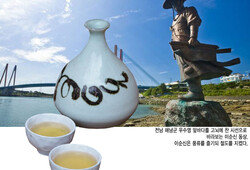


















![[밀착취재] 리딩방 70여 명 대부분이 한통속…기망하는 수법까지 매뉴얼화](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8/98/bd/694898bd2399a0a0a0a.jpg)


![[지상중계] 제12회 나지포럼, “북미 정상회담 성과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43/48/32/69434832107a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