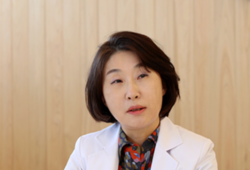- 잘못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낫다
- 경탄하고 감격하라, awesome!
- ‘참나’ 찾아 ‘자유’ 얻는 게 심층종교
- 행복의 원천은 성찰이 주는 ‘아하!’의 삶

‘동아일보’ 2001년 10월 11일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한다.
“오강남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미션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종교학과에 진학해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의 믿음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슬람이 모두 지옥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게 사실인 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캐나다 유학을 한 후 그곳에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워 ‘바가바드 기타’를 읽고 한문을 다시 공부해 노장사상과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그는 자기 안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가 대화하는’ 핵융합의 과정을 겪게 된다. 예수님의 성령체험이 ‘성불(成佛)’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노장에서 말하는 ‘붕새처럼 변화와 초월의 체험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니겠냐는 인식이었다.”
오 교수가 2001년 한국에서 출간한 ‘예수는 없다’라는 도발적 제목의 책은 파문을 일으켰다. 요지는 “역사적 예수는 있었으되 오늘날의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은 없으셨다”는 것이다. 그의 저술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는 소설가이자 번역가 이윤기(1947~2010)다. 가수 조영남(70)은 다음과 같이 그를 기억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강남 교수는 글로 먼저 만났다. 목사가 되겠다며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 미주지역 순회공연을 하던 1980년으로 기억한다. 공연을 마치고 우연히 누군가가 소일거리로 읽으라며 던져준 교포신문에서 그의 칼럼을 읽고는 섬뜩해졌다. 당장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나섰다. 그는 내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한국인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특별한 사람이다.”
오 교수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캐나다 맥매스터대 대학원에서 ‘화엄(華嚴)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교종교학이라는 말조차 생소할 때 동서 종교와 철학에 몰두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점에 획기적 변화를 경험했다. 서울대 규장각과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객원교수로 강단에 섰고,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14년 전보다 지금 한국 종교의 위상은 더 후퇴한 듯 보인다. 기독교 신자가 감소한다. 기독교와 불교 공히 사회적 소통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출간한 저서 ‘종교란 무엇인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는 때로 집단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간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개인의 번영만을 위한 종교, 권력에 기생하거나 스스로 권력화한 종교, 양적 대형화에만 골몰하는 종교. 과연 종교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7월 2일, 그에게 물었다.
▼ 종교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답이 있겠으나, 간단히 대답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속적 안목으로 볼 수 없는 실체의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해 더 큰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이 4가지 진리(四聖諦)를 깨침으로써 고통에서 자유스러워지라고 한 것, 그리스도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욕심과 미망으로 가려진 눈을 떠 사물을 더욱 명확히 보면서 그만큼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종교기업’
▼ 한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압도적 크기의 교회 간판이 보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십자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입니다.
“교회도 이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흐름에 영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십자가 물결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고 봐요. ‘종교기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붉은 십자가 대신 흰색, 노란색 십자가가 이따금 눈에 띈다는 거.(웃음)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예수가 달려 죽은 로마의 형틀이라는 생각 대신, 다석 류영모(1890~1981·교육자 겸 종교인)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대지를 뚫고 하늘과 하나 되고자 위로 솟남을 뜻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의미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요.”
다석이 설파한 ‘솟남’은 기독교의 부활, 불교의 해탈에 비견되는 표현이다.
▼ 교수님은 기독교도입니까. 한국의 일부 개신교도는 교수님을 배교자(背敎者)로 여기기도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화엄(華嚴)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에 관한 연구’는 불교 및 노장사상을 넘나들었고요.
“어머니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에 다니셨는데, 덕분에 저도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할 때도 기독교 극보수주의 교수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고요. 머리가 커지면서 어머니가 다닌 교회에서 가르친 것, 그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사상에 몰두했으니 캐나다에서는 동양 종교를 전공으로 택하기로 하고 불교, 힌두교, 노장사상을 본격적으로 접했어요.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불교를 전공 분야로 삼았고, 말씀한 대로 화엄의 법계연기를 학위논문 주제로 택했지요.
캐나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에서 다닌 교회의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글로도 써야 했기에 형식적으로나마 갖고 있던 교적(敎籍)을 철회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배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 종교나 교파를 헐뜯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적이 없어 어느 종교에도 정식으로 속하지 않은 셈입니다.
현재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퀘이커 모임에 참석합니다. 한국에 머무를 때는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에서 주관하는 ‘일요 경 모임’에서 종교 경전을 읽습니다. 이곳저곳의 교회나 교역자 수양회, 사찰에서 초대받으면 가서 강연합니다. 개인적 이력을 물은 것 같아 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겸연쩍습니다.”
▼ 한국 불교의 상황도 신자 수가 줄어드는 기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복(祈福)적 성향도 강하고요. 사업 잘되게 해달라,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며 시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찰(大刹)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지요. 뜻있는 스님들이 직접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불교계가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지 않는 건 알지만, 정법대로 해서는 사찰을 운영하지 못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속의 佛性, 神性
▼ 나와 내 가족의 복을 바라는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가족의 평안을 간구(懇求)하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종교는 나와 내 가족이 잘살고 싶다는 소망을 심리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하고요.
“물론 종교에 그런 면이 있어요. 종교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생래적으로 가진 물질적,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 예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한국 교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에 배타적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어구(語句) 탓에 비(非)종교인이 기독교를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영적 눈을 떠서 사물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속에 신성이나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의 근본은 우리가 이런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뜻이라고 하겠지요. 불교에서는 우리 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 속에 신성, 혹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고, 천도교에서는 시천주(侍天主)라고 해서 우리가 ‘한울님’을 모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늘과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아가 천도교에서 말하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처럼 남을 하늘 섬기듯 대하게 됩니다.
여러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기본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기들만 진리를 가졌다, 자기들만 하느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자기들만 천국에 간다는 등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곤란합니다. 봉은사역 역명 논란, 탱화에 낙서하기, 땅 밟기 기도 등 일부 기독교도의 행동은 기독교와 기타 종교들의 기본 진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땅 밟기 기도는 일부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의 성소에서 예배를 올리는 의식이다. 또한 기독교 목사가 대구 동화사 탱화에 낙서해 논란이 인 적이 있으며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명명을 두고 불교계와 기독교계가 갈등을 빚었다.

“‘관여하는 神’ 관념 수정돼야”
▼ 지난해 6월 문창극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 등으로 인해 낙마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할 만한 발언이라고 여겨지지만, 비(非)기독교인은 이러한 견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비(非)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부담스러운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지 지배나 미국·소련의 분단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6·25전쟁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 내지 미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졌다면 독립을 위해 식민지 정책에 대항해 싸운 운동가나 남북분단 상태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이가 되는 셈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관은 함석헌 선생이 한국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본 것과 판이합니다. 함 선생은 하느님이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저항하면서 이 고난의 역사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반면, 문 후보자는 우리 민족은 나태하고 무기력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나 미국의 개입 등 외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항과 자존의 역사냐, 숙명적 외세 의존의 역사냐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와 바울이 말씀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갈 6:15)를 꼽고 싶습니다. 종교에서 중요한 대목은 할례나 기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변화(transformation)를 받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장자’ 첫머리에 물고기가 변해 붕(鵬)이라는 큰 새가 되어 구만장천을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가 줄 수 있는 초월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 ‘닫힌 종교’가 아닌 ‘열린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느 특정 시대, 어느 특정 사회를 배경으로 생겨난 종교관을 비롯해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등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이해돼야 합니다. 하나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특수 교리는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특별한 해석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 혹은 절대자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해요. 옛날 패러다임에 입각해 신이 인간사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한다는 ‘관여하는 신(Interventionist God)’ 같은 신관(神觀)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열어놓음’이 중요합니다.”
표층종교와 심층종교
▼ 종교에는 표층(表層)과 심층(深層)이 병존하게 마련입니다.
“표층종교가 지금의 내가 잘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힘쓰는 자기중심적 종교라면, 심층종교는 나의 ‘참나’를 찾아 지금의 나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아가 이웃을 위해 힘쓰는 타인 중심적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표층종교가 신과 나를 분리해 생각하고 나와 나의 집단이 잘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비는 것과 대조적으로 심층종교는 신과 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랑과 자비를 중요시합니다. 표층종교가 경전의 문자에 매달려 나와 다른 해석을 하는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심층종교는 문자 너머의 속내를 발견하려 노력하고 나와 다른 해석에 열린 태도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표층종교로서 종교생활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지만, 거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표층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화 과정을 거쳐 종교가 줄 수 있는 시원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고 했습니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종교에나 존재하는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표층종교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종교적 근본주의는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도 않지만 그 자체로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는 게 교황의 설명인데요. 한국 가톨릭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가톨릭 지도자들이 가진 의식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신학자 한스 큉처럼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진보적 가톨릭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처럼 비교적 보수주의 내지 근본주의 성향을 보이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정의구현사제단 같은 진보적인 신부들이 있지요.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재 한국 가톨릭교회는 보수 경향이 강한 분들이 이끈다고 들었습니다.”
교인 성장률 1600%의 배경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러 면으로 공헌한 바가 컸습니다. 교육, 의료, 독립운동, 계몽…. 그러다 1970~8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하면서 전통적으로 친숙하던 농촌 공동체 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한 도시생활에서 소속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에서 새롭게 소속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 사람들 사이에 자본주의 가치관이 팽배하면서 부유해지려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는데, 교회에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물질적 축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부채질을 한 셈이지요. 이것이 교회가 기복적으로 경도된 주원인이면서 교인 수 증가의 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필요나 사회적, 심리적, 건강상의 소망을 교회가 아니더라도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그런 필요에 의해 교회에 다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자주의에 입각한 공격적 선교에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 성경의 문자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보는 대로’가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든 불경이든 경전을 읽는 것은 그것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해야 합니다. 경전이란 문자적으로 객관적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높이에서 읽고 이해하도록 구성됐어요. 이해의 깊이를 점점 더 깊게 해야 하고요.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이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 종교사회학자 필 주커먼의 책 ‘신 없는 사회’를 보면 라디오, 텔레비전에 나온 목사들이 죄악에 물든 이교도를 저주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고 주장하고요. 경찰서장이 범죄율 증가가 사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느 주지사는 자연재해에 기도로 대처하라고 호소하더군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시작을 알리면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신께서 미국을 변함없이 축복하시길”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친 것도 떠오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유럽에서 근본주의가 거의 사라진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에는 아직도 기독교 근본주의가 살아 있지요. 주커먼 교수가 지적했듯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실질적으로 ‘신이 없는 사회’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사회가 범죄율, 문맹률, 행복지수, 복지수준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섭니다. 교회 출석률이 높은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 지역 주들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근본주의에서 말하는 신들을 앞세우면 결국 ‘신들의 전쟁’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제도를 개선하거나 복지제도를 확장하려는 의지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들만의 신’ ‘만들어진 신’
주커먼에 따르면, 북유럽에선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이들도 성서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적었다거나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죽은 후 부활했다든지 하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핵심이다. 그들에게 성경은 품위 있는 도덕과 가치관이 담긴 책이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소수의 북유럽 사람들도 대체로 합리성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은 생전에 “모든 이교(異敎)의 군대가 무함마드의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미국이 결코 평화로울 수 없을 것을 신께 맹세한다”고 다짐하면서 “신은 위대하다. 영광이 이슬람에 있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이라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이슬람국가(IS)는 형제 격인 시아파마저 ‘불순한 이교도’라고 여깁니다. 불교나 힌두교와 다르게 유일신교인 크리스천과 무슬림은 ‘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종교만이 진리를 독점한다고 여기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직 한 분’인 하나님, 다시 말해 ‘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란 대부분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받드는 신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신 자체가 아니라 신에 대한 각자의 견해일 뿐이지요. 그들만의 신관(神觀)입니다. 궁극실재로서의 신, 존재의 바탕으로서의 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초월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첫머리에서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라고 밝힙니다. 말로 표현된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신관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만진 것만을 절대화하는 대신 서로 둘러앉아 각자 만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물 코끼리에 근접한 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종교 간의 화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세계 평화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awesome!’을 외치는 삶
▼ ‘그들만의 신관’은 ‘부족신관(部族神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직접 전투지휘관이 돼 다른 민족을 정벌합니다만….
“그렇지요. 자기 민족만을 위한 신, 자기 집단만을 위한 신을 받드는 게 부족신관입니다. 지금도 가령 운동경기를 하면서 자기 팀이 이기기를 신께 비는 것, 자기 종교만을 사랑하는 신을 받드는 것은 부족신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지요. ‘도덕경’에서 노자는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예수님도 하느님은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이 무조건 내 편,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망상인 셈이지요.”
▼ ‘신 없는 사회’가 오히려 평화롭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표층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표층종교는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 잘못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주커먼 교수가 지난해 ‘Living the Secular Life(종교 없는 삶을 살다)’를 썼습니다. 이 책은 경탄하고 감격하는 삶, ‘awesome(기막히게 좋은)!’을 외칠 수 있는 삶이 권위에 의존적인 종교적 삶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성찰과 깨달음에서 나오는 ‘아하!’ 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도 2012년 출간한 ‘종교를 넘어’에서 종교적 계율에 따라 강제되는 삶보다 선한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는 기본 원리에 입각한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한물간 패러다임에 입각한 옛 신관이나 세계관,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평화를 기본으로 여기고 삶을 사는 세계시민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 앞서 ‘장자’의 붕(鵬)과 ‘도덕경’의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천지불인(天地不仁)을 언급했는데, 노장사상이 21세기 한국과 세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장뿐 아니라 여러 종교의 심층이 활성화해야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노장이 오늘날의 한국과 세계에 기여할 대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도(道)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노장의 실재관은 오늘날의 세계관과 부합하는 점이 많습니다. 둘째, 도를 어머니나 여성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하는 등 여성성을 강조합니다. 셋째, 자연은 신비스러운 기물이므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하는 환경보호 내지 생태적 관심을 가졌습니다. 넷째,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면서 폭력, 전쟁을 반대합니다. 다섯째, 꾸미지 않은 통나무처럼 욕심을 줄이고 순리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섯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知者不言 言者不知)’면서 진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종교 같은, 종교 아닌 종교
▼ 한국 사회는 이념, 정치 성향에 따라 편갈림이 심합니다. 원효 스님의 화쟁(和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쟁은 요즘 말로 고치면 다원주의(pluralism) 혹은 시각주의(perspec tivalism)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물이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자는 뜻이에요. 똑같은 컵을 위에서 보면 동그랗고 옆에서 보면 모양이 다릅니다. 둘 중 하나만을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지만, 둘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싸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화쟁은 모든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불교 사상이다. 대립과 모순·쟁론을 조화·극복해 하나의 세계를 지향한다. 원효는 저서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서 화쟁 이론을 전개했다. 원융회통사상(圓融會通思想)이라고도 한다.
▼ 스님이 중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중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 파문 탓에 시끄러웠습니다. 기독교 교단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는 금품 살포, 상호 비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종교가 ‘소금’ 구실, ‘목탁’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세태를 어떻게 봅니까.
“어느 스님이 그러시더군요. 지금 한국 종교는 기업만도 못하다고. 기업은 돈을 번다는 것을 떳떳이 밝히고 돈을 버는데, 종교는 거룩함이라는 간판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오히려 기업보다 돈 벌기에 더 혈안이 된 상태라고. 종교가 물질만능주의로 변질되거나 권력화해 생기는 부작용이겠지요. ‘종교 같은 종교가 아닌 종교’를 보고 있다고나 할까요”.
▼ 우리는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실재의 더 깊은 차원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더 큰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이상학적, 심리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상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과 불의의 원인을 꿰뚫어 살펴보고 이런 현상을 타파하는 것도 종교가 할 일이라 봅니다.
인간의 근본적 사명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종교라면 존재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선불교에 살불살조(殺佛殺祖)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침으로 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부처도 조상도 죽이라는 뜻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잘라버리라는 말이지요.”
▼ ‘종교는 궁극실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하는 체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변화된 개구리,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개구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항해하지 못하다가 바다의 실재, 곧 바다에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멀리까지 항해할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백성’
▼ 한국 종교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랍니까.
“지금까지 이렇게저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표층에서 심층으로 심화돼야 하겠지요. 독일 신학자 카를 라너 같은 이는 그리스도교가 심층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양주시의 어느 큰 스님도 기복 일변도 종교로서의 불교는 역할이 끝났다고 말씀하더군요. 생각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종교의 심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개인은 종교와 관련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영성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과정신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존 캅 교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물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중세 그리스도교에서 강조한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 동방정교에서 행하던 예수기도(Jesus prayer), 선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지요.”
과정신학(process theology, 過程神學)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사조다. 인간과 세계의 진화론적 성격을 강조한다. 신도 변화해가는 세계와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헌금은 ‘욕심 줄이기’ 연습
▼ 헌금은 왜 하는 겁니까. 십일조는….
“히브리 성서(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에서 십일조를 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하면 미리 100만 원을 바치고 1000만 원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은 이처럼 내가 얼마를 내고 신의 축복으로 그 몇 배로 튀겨서 받는 투자나 투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욕심을 줄이는 연습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겠다는 인류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종교기관에 바치는 것이 그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지요.
십일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나뉘어 있을 때 각 지파가 수입의 10분의 1을 제사장 족인 레위지파에 바치는 제도에서 비롯했습니다. 레위족은 그것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습니다. 당대에는 일종의 세금이었던 셈이지요. 오늘날 십일조를 강제로 바치게 한다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만, 수입 일부를 진정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적절한 곳에 바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