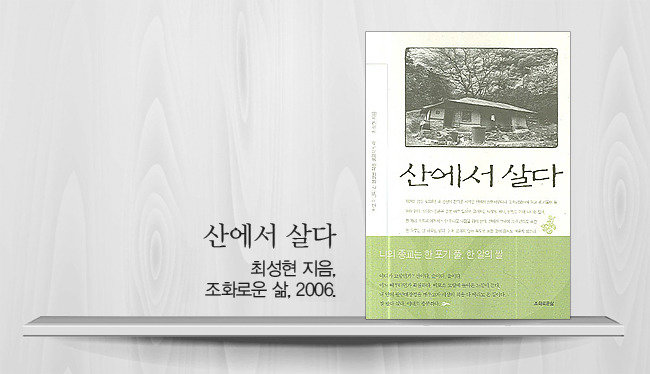
노루와 나를 묶어 ‘우리’라고 생각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까닭 모를 평온이 찾아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한라산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고, 그 산의 너른 품 안에서 우리는 첫눈에 서로를 알아본 친구가 된 느낌이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10초 안팎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경험한 최초의 ‘영원’처럼 느껴졌다.
도시 생활에 찌든 나 같은 사람도 가끔 산에 오르면 이렇듯 콘크리트 벽 안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느끼곤 한다. ‘산에서 살다’는 산을 ‘방문’만 할 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이 베푸는 모든 것을 알려준다. 남들은 가장 바쁘게 취직이나 출세를 향해 달려 나가는 시기, 최성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산속에서 농약도 비료도 거름도 쓰지 않고, 경운기나 트랙터를 사용해 땅을 갈지도 않고, 그저 자연의 힘과 인간의 보살핌만으로 농작물을 가꾸는 자연농법을 실천했다.
자연농법이라고 하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방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자연농법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여야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농법이다. 그 깊은 산속에서 온갖 곡식과 채소의 씨앗을 뿌리고는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고라니와 멧돼지, 온갖 산새와 애벌레들이 곡식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욕심 사납게 농약을 뿌려 ‘너희들은 먹지 말고, 우리 인간만 먹을 테야!’ 이렇게 하면 자연농법이 될 수가 없다.
나뭇잎의 권고를 듣다
인공적인 기계나 비료를 쓰지 않고 땅이 지닌 본래의 힘을 되돌리는 것, 그것은 땅의 힘을 살리는 길일 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건강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연주의자들의 바이블이 된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짚 한오라기의 혁명’의 번역자이기도 한 최성현은 산속에서 자연농법을 실험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철학자이기도 하다.산에서 혼자 살기가 심심하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읽으면 이 모든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일단 산에서 살면 심심할 틈이 없다. 산새들이 찾아오고, 다람쥐나 고라니 같은 온갖 산짐승이 찾아오며,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와 곡식과 채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심할 겨를이 없다. 그는 가끔씩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도 산에서 사는 지혜를 나눠줬다.
물론 힘들고 무서울 때도 있다. 하지만 커다란 멧돼지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 할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 했고, 마침내 평온을 찾아 멧돼지가 그대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공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면, 산짐승들은 좀처럼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수입이 극도로 줄어들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곧 풀린다. 산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같으니,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연은 인간에게 수많은 선물을 되돌려준다.
낙엽의 말을 들은 것은 3년 전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나뭇잎이 한꺼번에 지고 있었다. 장관이었다. 한참 바라보고 서 있는데, 문득 나뭇잎이 내게 말했다.
‘겨울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부지런히 돈을 벌라는 뜻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을 닦으라는, 안을 비우라는 간절한 권고였다.
-‘산에서 살다’ 중에서
그가 산에서 살며 배운 최고의 삶의 기술은 바로 ‘경청’이다. 이 책에는 ‘나뭇잎의 권고를 듣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한참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과연 나는 나뭇잎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던가, 되돌아보게 됐다. 그는 떨어지는 나뭇잎의 권고를 따라, 내면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한다.
입 없는 것들의 목소리
입 없는 것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경청’이기도 하지만 ‘교감’이기도 하다. 산에서 혼자 살다보면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모든 동식물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한다. ‘자기표현’이라는 담론에 갇힌 현대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관계들은 늘 불편했다. 나를 억지로 꾸미거나 포장해 남에게 보여줘야 하는 순간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런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애써 나를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곁에만 나는 오래 머물 수가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도 그랬다. 굳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사람을 보면, 숨이 찼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좋았다.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옆의 존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서로를 좀 더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기술이 아닐까. 경청하지 않으면, 오래오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가 반짝여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니. 다른 존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결국 무관심을, 나아가서는 폭력을 낳는다. 작가는 죽이거나 때리거나 욕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
“죽이고 때리고 욕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화나 짜증을 내는 것, 자신을 돌이켜 보지 않고 하는 말, 용서할 줄 모르는 것 따위가 모두 다 심각한 폭력이었다. 그렇게 바다는 내게 일러줬다. 험담, 무기력, 잔소리, 거친 말, 게으름조차도 폭력이라는 것이었다.”
폭력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존재, 내가 아닌 다른 사물에 대한 무관심은 ‘내가 이렇게 해도 저쪽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낳는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화를 내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 게으름도 폭력이 될 때가 있고 바쁨도 폭력이 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열심히 일하는데 거드름을 피우며 태만하게 굴 때, 게으름도 폭력이 된다. ‘나는 너무 바쁘다’면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스케줄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일상의 폭력이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모든 벌레를 ‘해충’으로 규정하는 것도 폭력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뿐인데, 인간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해충박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4대강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힌 것도 자연에 대한 무서운 폭력이며, 이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다른 존재들 ‘속에서’
‘산에서 살다’를 읽으며, 나는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수많은 폭력의 리스트를 떠올리며 몸서리쳐야 했다. 날벌레가 마구 날아든다고 손바닥으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풀씨가 몸에 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털어버리기도 했다. 벌레는 잘 달래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고, 풀씨는 흙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데려다줘야 했는데. 머리를 감느라 얼마나 많은 샴푸를 써서 물을 괴롭혔는지,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흙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 ‘망각’조차 폭력이 아니었던가.‘산에서 살다’를 읽으며, 나는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부끄러웠고, 마침내 나를 옭아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 조금씩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풀과 나무와 벌레와 새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때, 다른 존재보다 빛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 ‘속에서’ 빛을 찾아내려 할 때, 우리가 꿈꾸는 자연과의 진정한 공생은 시작되지 않을까.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행상’](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d/5f/99/699d5f9911b7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