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혼인신고를 한 A(원고·남)와 B(피고·여)는 김OO을 낳아 기르다 2006년 4월 협의이혼했다. 두 사람은 2006년 8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2007년 2월엔 A가 김OO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B에게 양육비로 매달 50만(2007~12년)~70만원(2013~18년)을 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07년 10월 위 약정을 무효화하면서 A가 B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아울러 B는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김OO을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로 약속했다. 이를 어길 경우 A에게 40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김OO은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OO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입양제도로는 안 되고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약정상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피고의 재혼, 즉 피고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두 사람 간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논리로 상고를 기각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

검사는 A를 강도상해죄로 기소했다. A의 요청에 따라 1심은 배심원이 참가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A가 고의로 금목걸이를 강취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그전에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상해에 대해서만 유죄로 평결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돼 채택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00/200/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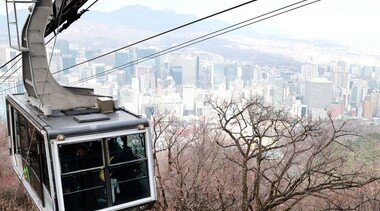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행상’](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d/5f/99/699d5f9911b7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