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錦湖) 김을생 선생은 ‘지리산 터줏대감’이다. 70 평생 지리산에서 살아온 그는 스님들의 발우를 만들어 팔며 지리산을 오가는 고승, 기인, 달사들과 교분을 나누었다. 요즘은 가만히 앉아 청산과 냇물에게 말을 걸 때가 많아졌다는 그는 이미 지리산의 일부다.

집 뒤에 작은 토굴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경전도 읽고 염불도 한다는 김을생 선생.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만끽하고 있다.
명산은 각기 지기(地氣)가 다르다. 지기가 다르면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의 성향도 달라진다. 계룡산은 역대로 예언자가 많이 배출되는 산이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운이 강한 탓이다. 그래서 계룡산에는 주역파(周易派)와 비결파(秘訣派)가 운집해 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계룡산을 더듬어야 한다.
속리산은 의술에 능통한 도사를 많이 배출한 산이다. 속리산파 인물들 가운데 침을 잘 놓거나 약 처방에 능통한 사람이 많은데 비로봉 밑 상고암(上庫庵)에 머무르면서 40년 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였던 학산(鶴山)스님이 대표적인 인물. 제자들에 따르면 학산은 평상시에도 밥을 잘 먹지 않고 자신이 약초로 제조한 환약(丸藥)을 복용했다고 한다. 밥 대신 환약만 먹으면서도 일생동안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비로봉 상고암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약 처방을 하면서 인술을 베풀었다.
설악산은 차력과 축지, 그리고 무술에 조예가 깊은 도인이 많았다. 산 전체가 험한 바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위가 험한 산들은 그 이름에 악(嶽)이나 악(岳)자가 붙는데, 이런 산에는 고대로부터 정신세계의 고단자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설악산도 마찬가지이다. 전통무예 ‘기천문’의 장문인이었던 원혜상인(元惠上人)이나 박대양(朴大洋)이 피나는 수련을 했던 곳도 설악산이다.
지리산 북쪽 사랑방 주인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 지리산. 둘레만 해도 850리나 된다. 설악산이 대표적인 골산(骨山)이라면, 지리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육산(肉山)이다. 골산은 바위가 돌출된 산이고, 육산은 흙이 두텁게 덮인 산을 일컫는다. 설악산이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산이라면 지리산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산이다. 육산이라서다. 역대로 지리산에는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신선들이 살았다. 산이 두텁고 먹을 것이 많아서 숨어살기에 좋다. 현재도 별다른 직업 없이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숨어사는 낭인과(浪人科)가 30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지리산을 말하면서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다. 금호(錦湖) 김을생(金乙生·69) 선생이다. 남원군 산내면 백일리에서 태어난 그는 일생을 지리산에서만 산 지리산 터줏대감이다. 전주에서 학교 다닌 때와 군대생활 외엔 타향으로 나간 적이 없다.
선인들은 지리산 산세를 청학과 백학이라는 두 마리 학에 비유해 지리산에는 ‘남비청학쌍계사(南飛靑鶴雙磎寺)요, 북래백학실상사(北來白鶴實相寺)라!’는 말이 전해져온다. ‘남쪽으로 날아간 청학은 쌍계사를 만들었고, 북으로 날아온 백학은 실상사를 만들었다’는 뜻. 즉 지리산 남쪽의 정기가 뭉친 곳이 쌍계사이고 북쪽의 정기가 뭉친 곳이 실상사라는 얘기다.
김을생 선생이 사는 백일리는 실상사 바로 앞에 있는 동네다.
이 동네 앞에는 1000년 전부터 전라도 남원의 운봉과 인월 사람들이 경상도 함양의 마천 쪽으로 넘어 다니던 길이 있다. 즉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붙어 있는 접경지역인 것이다.
김 선생은 이곳에서 나무로 발우를 만들어 팔면서 지리산을 오가는 고승, 기인, 달사들과 접촉했다. 발우는 승려의 밥그릇을 일컫는 말. 불가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그 징표로 옷과 발우를 전수할 만큼 승려에게는 필수품이다.
그는 목발우를 통해 평생 지리산 북쪽에서 사랑방 주인 노릇을 해왔다. 그가 축적한 ‘지리산학’과 ‘지리산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평생 지리산에 사셨지요. 어떻게 보면 산속에서 답답하게 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청복(淸福)을 받은 ‘상팔자 인생’ 같기도 합니다. 지리산에 사는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두보의 시에 나오는 대목인 ‘전어풍광공류전(傳語風光共流轉)’이라고나 할까요. ‘바람과 빛과 대화하면서 함께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나이 칠십이 되니 이 시구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서 청산을 보면 말을 걸고 싶습니다. 때로는 골짜기에 흐르는 냇물이 제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니 비로소 산천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풍광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낙입니다.”
-지리산에는 팔대(八臺)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인지 설명해주시죠.
“첫째, 남원군 산내면 상왕부락에 청신대(淸信臺)가 있죠. 둘째, 함양군 마천면 가흥부락에 금대(金臺)가 있습니다. 흔히 지리산의 제일 수행터를 금대라 할 만큼 알아주는 곳이죠. 일설에 의하면 지리산 산신이 여자인데, 금대가 있는 봉우리의 산신은 남자라고 합니다. 지리산의 여산신이 금대의 남산신을 바라보는 형국이죠. 그래서 금대에서 공부하면 지리산 여산신이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80년 전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 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찬 빗줄기 속에 여러 사람이 영차, 영차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다음날 금대에 가보니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금대의 나한전(羅漢殿)을 덮치려고 했는데, 바위덩어리 밑에 큰돌을 쐐기로 박아놓은 것이 보였다고 해요.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쐐기돌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장마에 나한전이 위험해지니까 나한들이 나타나서 신통력으로 바위가 나한전을 덮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대의 나한전은 영험한 곳이죠.
셋째, 함양군 휴천면 세동(細洞)부락에 마적대(馬跡臺)가 있습니다. ‘말의 자취가 있다’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고사 때문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이곳에 머물면서 함양 장날에 말에다 바구니를 묶어 심부름을 보내곤 했는데, 그러면 말이 바구니에 필요한 물건을 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바구니 속에다 쪽지를 넣어 보냈던 모양입니다.
넷째, 문수대(文殊臺)는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에 있습니다. 군자리를 넘어가면 도마마을이 있고, 그 뒤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문수암이 나옵니다. 문수암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인 데다 북향이라서 겨울에 좀 추운 것이 단점입니다. 문수대는 문수암 근처에 있습니다.
다섯째, 연화대(蓮花臺)는 뱀사골 뒤의 산내면 와운리에 있습니다.
여섯째, 묘향대(妙香臺)는 구례 산동의 반야봉 밑에 있죠. 이곳은 개운조사(開雲祖師)의 전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리산 마니아들 가운데 이백 살이 넘은 개운스님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분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죠. 그 분이 1790년에 태어났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무려 215세인 셈이죠. 도를 닦아서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된 겁니다. 일반인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겠지만 지리산에서는 가능한 신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래 200∼300년 동안 한국이 배출한 도인 가운데 최고단자가 바로 개운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분의 태생지는 경북 상주군 개운동인데, 도장산(道藏山) 심원사(深原寺)에서 도를 이룬 후 지리산 묘향대로 거처를 옮겨와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그 분의 거처를 찾으려 수십 명이 반야봉 일대를 수색했던 적도 있습니다. 개운조사가 남겼다는 ‘능엄경’이라는 책에 개운조사가 도를 닦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집에 77세인 향국(香國)스님이 머물다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평생 지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행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자 이 스님이 방바닥에 머리를 대고 무려 3시간이나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노인인 데도 장정과 같은 힘을 씁디다.
식사는 밥 대신 미숫가루와 생식만 해요. 향국스님이 ‘아직 선생을 만나지 못하였다. 선생만 만나면 훌훌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데요. ‘어떤 선생을 찾느냐’고 묻자 ‘지리산 어딘가에 살고 계시다는 개운조사를 찾는다’고 대답하더군요. 자신이 쌓아놓은 공덕이 부족해서 아직 선생을 못 만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스님은 개운조사를 만나려는 일념으로 걸망 하나 짊어지고 온 지리산을 유랑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곱째, ‘만복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뜻의 만복대(萬福臺)입니다. 구례 산동에 있는데, 펑퍼짐하게 생긴 것이 무척 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수성대(水聲臺)는 남원군 동면 중군리에 있습니다.”
실상사 터가 일본을 누른다
-지리산 실상사에는 일본과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실상사 터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기운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사 보광전에 있는 종에 일본지도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 스님들이 매일 종을 치면서 이 일본지도를 때리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실상사에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오는 겁니까.
“실상사 터는 백학(白鶴)이 내려앉은 자리입니다. 학의 한 발은 극락전으로 내려앉았고, 다른 한 발은 보광전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기운이 좋은 곳이죠. 절 주변에 평평한 전답이 2만평이나 돼 스님들이 살기에도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선(禪)이 유입된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죠. 고려시대 전성기에는 스님이 3000명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지리산에서 가장 큰 절이 실상사인데, 이 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연꽃 같습니다. 실상사 중앙에 목탑이 있는데, 이것이 연꽃의 꽃심에 해당합니다. 꽃심이라 돌이 아닌 나무로 탑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목탑은 1907년에 불탔습니다. 일본인들이 실상사에 불을 지른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이 불질러서 숙종 때 복원해놓았는데, 일제시대에 다시 불을 지른 거예요. 실상사 터가 일본을 누른다는 전설이 일본인들을 자극해 터를 망치려 한 듯합니다.
고려 말 나옹스님이 실상사에서 하룻밤 묵으며 기운이 흐르는 것을 보는데, 지리산 기운이 일본으로 흘러가더랍니다. 스님이 그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부연폭포에 큰솥을 집어넣으라고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솥이 1911년 장마에 강물을 타고 산청군까지 떠내려갔어요. 이를 본 산청군수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부연폭포에 묻혀 있던 솥이었죠. 그래서 1912년 산청군수, 함양군수, 남원군수가 합의해 다시 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솥이 하도 커서 장정 200명이 운반했답니다. 저의 선친께서도 어렸을 적 마을 어른들이 그 솥을 만들어서 부연폭포로 운반해 가는 것을 직접 보셨다고 해요. 올해가 2004년이니 부연폭포에다 새 솥을 묻은 지 92년이 되었네요.
고려 때부터 왜구가 경상도 진주로 들어와 황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오면 곧바로 지리산 실상사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구가 마천 쪽에 진을 치고 장기간 머무르기도 했다는 구전도 있습니다.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하면서 왜구 대장 ‘아지발도’를 죽인 곳도 남원의 인월과 운봉 근처입니다. 실상사와 아주 가까운 곳이죠.
지리산과 실상사는 고려 때부터 왜구와 격전을 벌인 곳이죠. 경상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상사는 전답도 승려도 많으니, 왜구와 맞서 싸우는 일종의 진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본을 누르는 풍수전설이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부연폭포의 솥도 그런 거죠. 현재 부연폭포 옆에는 ‘부연정’(釜淵亭)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발우에는 주로 은행나무 사용
김을생 선생의 생계수단은 나무로 된 발우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조선조부터 김 선생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업이기도 하다. 목기(木器) 하면 남원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백일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목발우를 만들어낸 곳이다. 신라말이나 고려초로 추정되는데, 처음에는 실상사 스님들이 직접 발우를 만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술이 백일리 사람들에게 전수됐던 것 같다.
그렇다면 실상사에서 목발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지리산이다. 실상사는 지리산 깊숙한 지점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목기나 발우를 만들기에 적당한 재료를 구하기 쉬웠을 것이다.
백일리 사람들은 지리산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는다. 그 움막 속에서 숙식을 하며 나무를 베고 껍질을 벗겨내 제기나 발우 형태로 대충 깎는다. 이걸 ‘초갈이’라 한다. 도자기의 초벌구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 초갈이한 제기나 발우를 지게에 지고 동네로 내려와서 ‘재갈이’를 한다. 초갈이 상태의 목기를 6개월 정도 말린 후 재갈이에 들어간다. 바로 재갈이에 들어가면 나무가 갈라지기 때문. 재갈이를 마친 후 옻칠을 끝내면 완제품이 되는 것이다.
발우에는 주로 은행나무를 사용한다. 은행나무의 성질이 둥그런 형태를 띠어서 둥그런 그릇을 만드는 데 적격이다. 발우는 스님들의 배낭인 ‘바랑’ 속에 넣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게 좋은데, 은행나무는 재질이 무척 가볍다.
발우는 만들기가 꽤 어렵다. 보통 발우는 4합, 5합, 7합, 15합까지 있다. 4합이라 하면 그릇이 총 4개인 것을 일컫는데 이 4개의 그릇이 서로 포개져 하나의 그릇처럼 보여야 한다. 서로 포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4합의 용도는 국그릇, 밥그릇, 물그릇, 반찬그릇이다. 5합이면 1개가 더 추가된 형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발우가 15합이다. 15개의 그릇이 일목요연하게 큰 그릇 하나로 포개져야 하기 때문. 15합은 토굴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주문한다. 또 15합은 제기로도 쓰인다. 4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
요즘은 스님들뿐 아니라 여신도들이 발우를 많이 사간다. 90년대 중반 이후 50대 후반의 여신도들이 절에서 한철을 보내는 풍습이 생겼다. 이들이 지내는 선방을 ‘보살선방’이라 부른다. 보살선방에 다니는 여신도들이 선방생활의 필수품인 발우를 사가는 것이다. 해인사 원당암(願堂庵)과 인천 용화사(龍華寺), 부산 안국사(安國寺)가 유명하다. 원당암에서 수행하는 보살은 60∼70명쯤 되고, 용화사는 100여명, 안국사는 200∼300명쯤 된다고 한다.
자연산 옻칠의 효능
발우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옻칠이다. 옻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수명이 결정된다. 옻칠도 실상사가 원조다. 옻칠의 재료는 주로 함양군 마천에서 생산되는데, 마천은 우리나라 3대 옻나무 생산지 중 하나다. 요즘은 자연산 옻칠 대신 화학도료를 칠하기도 하는데, 자연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자연산은 한번 칠하면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물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화학물감으로 칠한 것은 오래되면 들떠버린다. 칠이 나무에 침투하지 못하고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 화학도료는 물 속에 들어가면 벗겨져버린다.
김을생 선생은 자연산 옻칠의 장점을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나무에 침투력이 강하다는 것. 침투력이 강해야 벗겨지지 않는다. 둘째, 처음에는 새까맣지만 시간이 흐르면 은은하게 변하면서 윤기가 난다. 셋째, 살균, 살충 효과가 있어 좀처럼 좀먹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옻은 구충제로 사용됐다. 넷째, 항암 효과가 있다. 다섯째, 옻칠한 목기에 밥을 담아 놓으면 밥이 쉽게 상하지 않는다. 곰팡이 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방수 기능이 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송대(宋代)의 보물선이 700년 동안이나 갯벌 속에서 견뎌낸 것도 나무로 만든 배에 옻칠을 했기 때문이다.

지리산 기운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큰솥을 집어넣었다는 부연폭포. 뒤에 보이는 정자가 부연정이다.
일본의 옻칠은 정제해서 매끄럽지만 조선의 옷칠은 거칠다. 3년 전 도쿄대학에서 옻칠을 연구하는 한 교수가 김을생 선생을 찾아온 적이 있다. 그 교수는 “조상이 목기쟁이를 하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사람”이라면서 “목기의 발원지를 추적하다 보니 지리산까지 오게됐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김 선생이 만들어 놓은 목기 중 매끄럽게 옻칠한 것이 아닌 투박하고 거칠게 만들어진 것을 골랐다. 그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매끄러운 제기에는 멋이 없다. 이처럼 거친 것이 우리 조상들 스타일”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발우 제작자이기도 한 김 선생에 따르면 발우는 북방 불교권 나라 중 한국에서 가장 발전했다고 한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서는 승려들이 부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고 탁발로 해결한다. 탁발에서는 큰 그릇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 개의 밥그릇을 포개는 발우는 필요없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에서도 발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 승려들이 발우를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거의 없다. 일본을 보자. 일본은 대처승이 주를 이룬다. 대처승은 집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발우는 필요없는 물건이다.
한국 불교에서만 발우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4합이나 5합 발우처럼 몇 개의 그릇을 한꺼번에 포개서 사용하는 방식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15합 발우. 15개의 그릇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포개져야 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좌). 김을생 선생은 지리산 자락에서 나무로 발우와 제기를 만들며 평생을 보냈다. 사진은 제기(우).
선승들은 한군데 오래 머물지 않고 전국의 여러 사찰과 암자를 돌아다니며 수행한다. 그런 만큼 밥그릇의 무게가 가벼워야 하는데, 나무로 만든 발우는 가볍고 휴대에도 편하다. 또 떨어뜨려도 여간해서 깨지지 않고 어지간히 부딪쳐도 금가지 않는다. 옻칠만 잘하면 대를 물려 쓸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촉감도 좋다. 목기는 손으로 만질수록 윤이 나면서 촉감이 더욱 좋아진다. 평화의 그릇이자 공존의 그릇인 것이다. 목발우의 이러한 장점은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선승들에게 최고의 휴대품이었던 것이다.
15년 동안 300여 사찰 답사
김을생 선생이 목발우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 그는 군대생활 10년을 마치고 고향인 백일리로 돌아왔다. 도시로 나가지 않고 첩첩산중 지리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였고 자연스레 가업을 물려받았다.
그는 발우를 만들어 전국에 팔러 다녔다. 1상자에 발우 10개가 들어가는데, 보통 무게가 15kg 정도 나간다. 한번 나갈 때마다 2상자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을 찾아다녔다. 장사도 장사지만 전국의 산천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절에서 목탁소리를 듣고, 아침에 법당에 나가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절 뒤 숲길을 거닐면서 새벽 공기를 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그가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돌아다닌 사찰이 대략 300군데에 이른다. 스님의 필수품인 발우를 파는 직업이었기에 가능한 답사인지도 모른다. 팔자에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여러 스님과 사귀게 됐다. 그 시절 만났던 젊은 스님들이 이젠 50대 중반의 주지가 되었다. 다시 만나면 마치 피붙이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한다.
-발우를 팔러 다니면서 만난 스님 가운데 인상 깊었던 분이 있습니까.
“서암(西庵)스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어른이 문경 봉암사에 계실 때 뵌 적이 있습니다. 봉암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공부 분위기가 잡혀 있는 절이죠. 아마 1980년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암스님의 방에 들어가니 ‘처사, 앉아봐’ 하시면서 제게 ‘칠시(七施 : 7가지 보시)’를 아는가’하고 물었어요. 전통적으로 불가에서 내려오는 보시법이라고 해요.
칠시는 다음과 같아요. (1) 신시(身施) :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 몸을 반듯하게 간수해라. (2) 심시(心施) :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다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 (3) 안시(眼施) : 눈빛을 좋게 비추어라. 상대방을 사납게 노려보지 마라. (4) 안시(顔施) : 사람을 대할 때 얼굴빛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 (5) 방시(房施) : 손님을 위해서 방을 잘 청소해라. (6) 좌시(座施) : 어른이 오면 앉는 자리를 정돈해라. (7) 언시(言施) : 말을 부드럽게 해라.
저는 서암스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람을 대할 때 얼굴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암스님은 한낱 발우 장사인 저를 봉암사 동구 밖까지 전송해줬습니다. 지금도 스님의 따뜻한 마음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덕 있는 분이셨죠. 그 칠시의 가르침을 들은 후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발우 장사를 하면서 보시를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우를 사간 스님이 반품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줬습니다. 사용하다가 실수로 발우를 상하게 했어도 별다른 말없이 바꾸어주곤 했죠.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이게 다 보시한 것이더군요. 그러면 스님들이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기고 다음에 꼭 다시 팔아주곤 했습니다. 세상사는 돌고 돕디다.”
토굴가와 산중가
금호 김을생 선생은 집 뒤에 조그만 토굴을 하나 지어놓았다. 일과가 끝난 후 토굴에 올라가 경전도 읽고 염불하며 기도도 한다. 토굴 벽에는 투박하게 쓴 붓글씨로 ‘토굴가(土窟歌)’와 ‘산중가(山中歌)’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의 인생회향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흰 구름 안개 속에 초가 삼간 지어놓고, 잠시 앉아 세상만사 다 잊으니, 내 마음 한가롭네. 산골짜기 시냇물은 반야를 노래하고, 동산에 밝은 달 맑은 바람은 나를 선경으로 이끄네’(토굴가).
‘날마다 산을 봐도 볼수록 좋고 물소리 노상 들어도 들을수록 더욱 좋네. 그 가운데 저절로 귀와 눈 맑게 트이니 내 마음 신선이네’(산중가).
이틀 간의 인터뷰를 마친 후 서둘러 카메라 가방을 둘러메고 고갯길을 내려가려는 필자에게 김을생 선생이 나지막하게 한마디 던졌다.
“세상사 어지간히 하고, 보름달이 뜰 때면 우리 토굴에 놀러와서 달이나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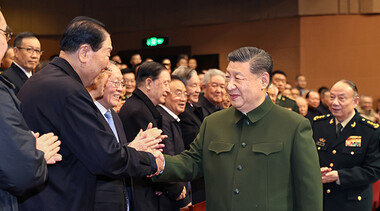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반중 지도자군(群)’의 행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e/7c/5e/699e7c5e023b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