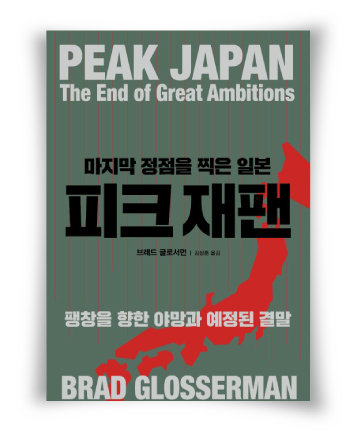
브래드 글로서먼 지음, 김성훈 옮김, 김영사, 428쪽, 1만9800원
도쿄올림픽 개막은 2021년 7월로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내년 개막도 불투명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꿈은 유리잔 깨지듯 산산조각 났다. 애초 아베 총리는 “올림픽 경기를 15년간의 디플레이션과 경기 하락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한 터였다. “아베가 제2기 총리를 역임하면서 어떤 단일 사건도 2020년 올림픽만큼 무게감이 있거나 더 화려하게 빛을 발하지 않았다.”(340쪽) 올림픽을 통한 경기 부양을 꿈꾸었던 거다.
사실 저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올림픽 효과’에 냉소적이었다. 미국인인 저자는 1991년부터 마이니치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일본 사회를 관찰해 왔다. 그는 올림픽이 “일본의 재부활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점을 찍은 일본’에 대한 작별을 고하는 계기가 될 것”(346쪽)이라고 했다.
왜 그런가. 일본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8년 일본은 전 세계 부의 16%를 차지했고, 이듬해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일곱 곳을 보유하고 있던”(34쪽) 국가였다. 그렇던 일본이 21세기가 되자 전례 없는 위기감에 휘감겼다.
저자의 해석대로라면 그 한복판에 ‘4대 쇼크’가 있다. 리먼 사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센카쿠 분쟁, 동일본 대지진이다. 리먼 사태로 수출 의존적이던 일본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해외 자본 흐름에 의존하던 일본 금융기관도 위기에 빠졌다. 정작 54년 만에 정권을 쥔 민주당은 통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고노 다로 자민당 의원의 말마따나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다. 이보다 더 못할 수는 없을 정도로 말이다.”(123쪽)
그사이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분쟁이 벌어졌다. 한 일본 관료는 “대부분 일본인은 일본과 중국 간 세력 균형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일본의 시대는 끝났다”(186쪽)고 고백했다. 2011년 3월 11일 ‘확인사살’처럼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다. 저자는 “그날의 사건은 일본인의 삶을 지배해 왔던 안락함과 확실성을 빼앗아갔다”(241쪽)고 표현했다. 4대 쇼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베의 재등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팽창’과 ‘부활’을 주창하며 ‘일본의 꿈’을 팔기 시작했다. 그 꿈이 신기루였음을 팬데믹이 증명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책의 해제를 쓴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에 일본의 최근 변화는 롤 모델이자 반면교사”(357쪽)라고 했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행상’](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9d/5f/99/699d5f9911b7a0a0a0a.png)

![[영상] 김다현 “언제나 내 편인 ‘얼씨구다현’과 함께 붉은 말처럼 달리렵니다”](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8b/df/02/698bdf022269d2738e25.jpg)